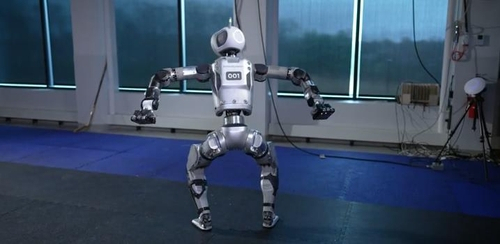마에스트로 친구가 있다. 구자범 지휘자다. 그는 놀라우리만치 박학하고 예술적 감각이 선하며 여린 마음의 소유자다. 그가 지휘봉을 잡고 무대에 설 때의 카리스마는 가히 외경스럽기까지 하다. 한번은 필자가 지리산 산행을 떠나기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다. 사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가 그는 바그너 작품에 대해 평하기 시작했다. 바그너를 사상적으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바그너 작품의 몇몇 부분을 들으면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바그너 음악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숭고하다. 그것은 신을 대면한 사람이 느끼는 종교적 숭고가 아니라 음악 자체를 신성하게 만들어놓은 예술적 숭고함이다. 바그너 음악의 과장된 격정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음악 문외한인 필자는 전문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헤어질 무렵 친구는 필자게 말했다. 왜 산에 가느냐고 말이다. 이렇게 무더운 장마철에 힘들고 위험하게 왜 산에 가느냐고. ‘산이 있으니까 간다’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 답했다. 이미 진부해져버린 이 말은 친구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갔다. 그런 일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상대의 표정에서 말의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친구의 모호한 표정을 보는 게 안타까웠지만 당시에는 좋은 해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임기응변이 신통치 않은 필자의 우둔함 탓이다. 그때 못한 답변을 여기서 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인(仁)에 대한 물음에 각양각색으로 답했다고 한다. 대화의 맥락에 따라 묻는 사람에 따라 달리 대답해서 공통분모들을 통해 하나의 정의를 구성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한다. 예컨대 인에 대해 공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己所不欲勿施於人)’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愛人)’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라 말했고 어떤 때는 ‘말을 더듬는 것(其言也?)’이라 대답하기도 했다. 이들 대답에서 공통분모를 찾기는 힘들다. 공통분모를 발견해 나열하더라도 그것은 대개 김빠진 맥주처럼 맛이 없기 마련이다. 백과사전만 가지고는 절대로 타인에게 가 닿는 화법을 구사할 수 없다. 할 수만 있다면 공자처럼 질문한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그의 세계관, 습관, 지적 수준, 관심사 등) 속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다.
복기를 해보면 친구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날 그가 꺼낸 단어 ‘숭고’를 열쇠말로 구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친구가 바그너 음악에서 신성한 숭고를 느꼈고, 그래서 자주 바그너를 듣는다면 필자는 지리산에서 자연의 숭고를 체험하기에 그곳에 간다고 말이다.
통상 아름다움은 자연미와 예술미로 구분된다. 어떤 이는 자연미를, 다른 이는 예술미를 우위에 놓는다. 자연미를 우위에 놓는 전통적인 근거는 자연을 신의 작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예술미를 우위에 놓는 근거는 인간이 자연 초월적인 존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숭고도 마찬가지다. 자연에서 더 큰 숭고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작품에서 더 큰 숭고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우열을 따지는 행위가 대개 유치하기에 그저 취향의 차이 혹은 경험치의 차이로 보는 게 낫다.
숭고 대상은 절대적으로 크고 강력하다는 느낌을 환기시킨다. 숭고는 불쾌감으로 시작한다. 엄청난 크기와 위력을 지닌 존재에게 짓눌리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공포다. 아직 숭고는 아니다. 공포가 강렬한 즐거움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숭고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전환의 계기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지만 에드먼드 버크에 따르면 두려운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 불쾌했던 감정이 유쾌함으로 변모된다. 공포 영화에 몰입해 강렬한 두려움이 일었다가도 ‘이건 가짜야!’라는 각성을 통해 가슴을 쓸며 안도했던 어릴 때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반면 자연의 숭고는 ‘진짜’ 위험하다. 그 숭고를 경험하려면 고된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인적 없는 설산(雪山)이나 운해(雲海)의 숭고를 경험하려면 악천후를 뚫고 두 다리로 걸어 입산해야 한다.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되고 위험해도, 아니 그렇기에 그 체험이 더 리얼할 수밖에 없다. 더 강렬할 수밖에 없다. 그 경험을 통해 압도적인 타력에 대한 맨몸의 저항력도 생기며 무력한 이에게는 더욱 더 공감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술적 숭고가 따라잡기 어려운 미덕이다.
‘친구여, 이래서 난 지리산에 오른다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