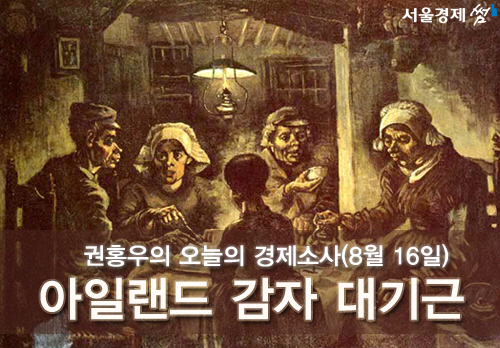불과 7년 만에 주민의 25%가 사라진 곳이 있다. 1845년부터 1852년까지 아일랜드에서는 11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진 사람도 100만 명을 넘는다. 아일랜드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든 것은 기근. 주식인 감자에 돌림병이 들어 발생한 ‘감자 대기근(Irish Potato Femine)’ 탓이다.
18세기 중엽 발생한 아일랜드 대기근은 문명사에서도 예외로 꼽힌다. 유럽에서 대규모 기근은 사라졌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경제사가 ‘오 그라다’에 따르면 잉글랜드의 경우 16세기 초반, 프랑스는 16세기 후반 이래 주목할만한 기근은 발생하지 않았다.(신혜수, ‘아일랜드 대기근에 대한 일고찰’에서 재인용)
감자 전염병이 아일랜드에서만 발생한 것도 아니다. 미국 농가의 감자밭을 휩쓴 ‘감자 잎마름병’이라는 전염병에 대해 영국 최초의 보도가 나온 시점은 1845년8월16일. 원예 전문지인 가드너스 크로니컬(The Gardeners’ Chronicle)지가 ‘영국 남부 와이트 섬에 잎마름병 변이종이 상륙했다’고 보도한 게 시초다. 첫 보도 이후 각지에서 무수히 많은 보도가 쏟아졌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북부 프랑스와 영국 남동부 지역이 전염지역으로 입에 오르내렸다. 얼마 안 지나 감자 잎 마름병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전 유럽이 공유한 전염병에서 왜 아일랜드만 극심한 피해를 받았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여건. 덥고 습기가 많은 기후로 전염 속도가 빨랐다. 두 번째로 감자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밀과 귀리 같은 작물은 대부분 영국으로 반출되고 아일랜드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감자 재배에 매달렸다.* 세 번째는 영국 식민당국의 뒷북 행정과 식민지에 대한 차별. 번번이 대응 방향을 잘못 잡고 시기를 놓치면서도 문제를 중시하지 않았다.
영국은 아일랜드 감자 농사가 완전히 망가지자 공공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효과가 거의 없었다. 나중에는 미국산 옥수수를 들여와 낮은 가격에 판매했으나 이마저 살만한 농민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 아일랜드인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전체 소출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점. ‘아일랜드를 구제하려는 곡물을 실은 선박이 한 척 입항하면 아일랜드산 곡물을 적재한 선박 5척이 항구를 빠져 가나는 식’이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마당에서도 곡물 수출을 강행한 계층은 부재 지주. 영국인이나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인 땅 소유주들은 구제보다 자기 몫 챙기기에만 눈을 돌렸다. 심지어 대기근의 틈을 타 소작인들을 쫓아내는 악행도 유행처럼 번졌다.** 굶기 직전에 집까지 잃은 사람들은 외국 행을 택했다. 이민선의 위생 환경도 형편 없었다.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던 110만명의 이민 가운데서도 20만명은 대서양의 배 안에서 죽었다.
아일랜드의 비극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농사가 어려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미국행 배를 타기 위해 짐을 꾸렸다. 영국인들은 그 때마다 아일랜드를 짜냈다. 작물에 대한 전염병이라는 천재(天災)와 영국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라는 인재(人災)가 합쳐진 감자 대기근의 시제는 과거 완료형일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예전에 유니온 잭(대영제국 깃발) 밑에 있었던 지역들의 인구를 보자.
오늘날 아일랜드의 인구는 638만명. 대기근 발생 전인 1841년 영국이 실시했던 인구 총조사에서 파악됐던 820만 명보다 22%나 적다.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과 소득이 올라가는 초기에는 당연히 인구도 증가하기 마련. 대영제국도 그랬다. 같은 비교 기간(1841년과 2015년)중 잉글랜드(웨일스 포함)의 인구는 1,590만명에서 5,509만명으로 세배 반 가까이 증가했다. 스코틀랜드 역시 260만명에서 537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아일랜드 정치인들이 농민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대기근의 화를 키웠다. 아일랜드는 1801년 영국과 통합 이후 105명을 영국 의회 하원에, 28명을 상원에 보냈으나 따로 놀았다. 1832년부터 1859년 동안 의원의 70%가 지주 또는 지주의 아들이어서 아일랜드 주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의 초기 작품에서는 영국에 항거하려는 아일랜드 정치인을 영국이 스캔들 조작 등 술수를 부려 무력화시키는 대목이 자주 등장한다.
아일랜드의 감자 대기근과 강제 퇴거를 과거형으로 볼 수 없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지구촌의 농업생산력은 인구 120억명을 먹여 살릴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기아에 허덕인다. 질병퇴치 노력과 자선은 비난 받아야 할 행위라고 강조한 맬서스주의 역시 건재하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 입었을 뿐이다. 상위 20%가 80% 위에 군림한다며 걱정했던 게 불과 30여년 전인데 세상은 0.1%가 99.9%를 지배하려는 구도로 변해가고 있다. 일방적 쏠림은 언제나 위험하다.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감자가 영국에 들어온 것은 1586년. 해적 출신이자 영국 해군 부사령관을 지낸 프랜시스 드레이크 선단이 싣고 왔다. 화물 ‘감자’의 화주는 토머스 해리엇(Thomas Harriot). 부등호(>, <)를 처음으로 문서에 남긴 수학자이며 태양의 흑점을 연구하던 천문학자인 그가 북미산 감자를 들여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신인 월터 롤리 경의 수학 개인교사를 맡았던 인연 때문. 여왕의 명령으로 북미를 개척했던 롤리 경은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던 아일랜드에도 씨앗 감자를 보냈다.
아일랜드 농부들이 감자를 기른 결정적인 사건은 명예혁명. 잉글랜드 본토에서만 피를 흘리지 않았을 뿐, 독립과 자치를 요구하던 아일랜드를 윌리엄 3세와 메리여왕의 네덜란드 군대는 철저하게 짓밟았다. 얼마나 가혹하게 아일랜드를 유린했는지 농토마저 남아나지 않았다. 더욱 척박해진 환경과 소작의 대가로 얻은 땅 한 뙈기에 심을 작물로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인들이 수탈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감자를 심을 수 밖에 없었다.
** 1846년 서부 밸린그래스에서 한 부재 지주가 군 병력을 동원해 소작농 76가구가 사는 마을을 불 태우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강제 퇴거가 줄을 이었다. 강제 퇴거 이유는 감자 흉작으로 소작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 연간 수입 4파운드 이하인 소작농을 거느린 지주들이 구빈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규 또한 강제 퇴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금을 내느니 소작농들을 몰아내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대농장을 만들겠다는 지주들의 선택으로 약 30만명이 고향에서 영원히 쫓겨났다.
영국인 부재지주 중에서 소작인들을 축출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뿐이었다. 강제 퇴거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 정도로 영국인들은 아일랜드를 괴롭혔다. 지주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만든 밑바닥에는 민족적 우월감과 맬서스주의가 깔려 있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빈민가를 더 좁고 더럽게 만들어 전염병이 돌도록 유인해야 한다’던 경제학자 맬서스식 사고로 영국인들은 ‘열등민족 아일랜드의 불행’을 당연한 귀결로 여겼다.
*** 1879년에도 아일랜드에는 흉작이 들었으나 아일랜드의 농장을 소유한 부재 지주인 예비역 대위 찰스 보이코트는 소작료를 악착같이 거둬갔다. 참다 못한 아일랜드인들은 ‘토지연맹’을 결성하고 소작료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보이콧 대위는 소작인들을 내쫓고 다른 지역의 농부들을 불러들였다. 소작인들은 결국 ‘토지연맹’ 아래 뭉쳐서 농장주 보이콧에 대한 소작을 거부해 승리를 따냈다. 영어의 일반 명사로 자리 잡아가는 ‘보이코트’란 단어도 아일랜드 농민들의 투쟁에서 나온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