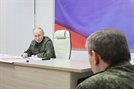현대차는 일단 최악의 사태를 막았지만 그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모두 24차례에 걸친 파업으로 14만대의 생산차질과 3조1,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현대차 파업 사상 최악의 피해규모다. 이뿐 아니라 협력사들은 1조3,000억원의 매출손실을 봤고 전체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러니 기본급 4,000원 더 챙기려고 국가경제를 뒤흔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나마 노조 집행부가 협상안에 도장을 찍은 데는 리콜사태와 긴급조정권 발동 등 외부 요인 탓이 더 크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긴 소중한 일터가 물에 잠겨도 파업기간이라며 정상조업을 가로막은 노조에 양보와 희생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설령 파업이 끝나더라도 현대차의 진정한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내수와 수출이 20%나 쪼그라들며 올해 813만대의 생산목표 달성도 어려워졌다. 여기다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리콜 이슈는 현대차가 애써 쌓아올린 품질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런 내우외환을 넘자면 무엇보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쳐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이런데도 현장 노조 일각에서는 푼돈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회사가 엄혹한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오직 제 밥그릇만 챙기고 귀족노조의 단맛을 즐긴다면 결국 파국만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