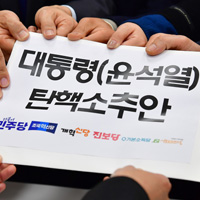OTT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업체가 있다. 유료가입자 5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에서 고공행진 중인 인터넷 미디어 OTT 1위 업체 ‘푹(POOQ)’이다. 푹은 지난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해 이동통신사, 가전사와 제휴했지만 일정기간 정체기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인터넷 동영상 시장의 잠재 가능성을 확신하고 OTT업체로 변신한 이후 급성장 모드로 돌아섰다. 푹의 김용배 대외협력팀장을 만나 그 비결을 들어봤다.
(*‘푹’은 들리는 그대로 콘텐츠에 ‘푹’ 온전히 몰입하라는 의미다. p와 q가 사람이 마주보는 형상으로 ‘소통’을 의미하기도 한다)
“‘푹’은 한국의 넷플릭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유통 플랫폼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기업이지만 장기적으로 미디어 공룡이 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푹은 스마트TV, PC, 모바일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만 있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인기리의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일종의 ‘콘텐츠 박스’다. 14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 분석 결과 콘텐츠 유통 사업자인 티빙, 왓차플레이 등 국내 8개 OTT 중 타 서비스에 앞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통신사·방송사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콘텐츠 저작권을 가진 홀더(제작자)에게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한 점”이 성장 비결이라고 말했다.
통신사와 배급사가 주도하는 방식은 지속성장 어려워
콘텐츠 제작자에게 수익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푹’
푹은 영상이 재생될 때 10초 단위로 북마크 데이터(빅데이터)를 쌓는다. 누가 어떤 콘텐츠를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시청 점유율이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정확하게 수익을 분배한다. 김 팀장은 “가입자가 100만이 됐고, A라는 채널이 10% 시청층을 차지한다면 나중에 구독자가 늘어 A사의 시청점유율이 일정해도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 강자 ‘AT&T’가 미디어 사업 방식을 바꾸기 위해 콘텐츠 강자 ‘타임워너’를 만난 것처럼 푹도 콘텐츠 파워가 있는 사업자들이 힘을 합쳤다. 처음엔 지상파 콘텐츠의 모바일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한 푹은 종편, 보도채널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들과 연대하면서 힘을 배가시켰다. 하지만 이동통신 가입자에 저가, 무료로 제공되는 제휴방식은 콘텐츠 가치를 낮추는 부정적 효과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사업은 각 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콘텐츠를 사들이고 공동으로 가격을 낮추는 치킨게임으로 변질돼 콘텐츠 값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졌다.
콘텐츠 가치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지난해 푹은 2.0으로 재탄생하고 통신사에 의존하는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직접 구매해 독자에게 제공하는 홀로서기를 단행했다. 김 팀장은 “시청자에게는 방송, 영화, 미드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받은 수익금은 철저하게 계산된 알고리즘으로 콘텐츠 홀더(제작자)에게 돌아가게 했다”고 말했다.
콘텐츠를 보는 수익이 고스란히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구조는 좋은 콘텐츠 양을 늘이고 독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 유료독자 가입 수는 2015년 22만명에서 2016년 50만명을 넘어서며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이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해외 6대 메이저 스튜디오, 국내 주요 배급사의 영화 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초기 지상파 방송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 하던 데서 벗어나 디즈니, BBC, 내셔널 지오그래피, FOX, KISS 등 라이브 채널만 65개, 방송 VOD 20만개, 영화만 5,000편 이상까지 확장됐다.
버라이즌이 인터넷 사업자를 찾는 것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중요성 인식한 것
콘텐츠 공유 패러다임 바뀌면 많은 부가가치 창출된다
23일(현지시간) WSJ은 미국 1위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콘텐츠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할 기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콘텐츠를 사는 것이 장기 미디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의미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 어떤 한계를 느끼냐는 질문에 김 팀장은 “푹은 수준높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수급하고 있는데, 콘텐츠 분야에서 아직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저가 가격경쟁’에서 ‘콘텐츠 차별화 경쟁’으로 전환해 간다면 OTT 분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팀장은 우선 콘텐츠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푹의 인프라로 많은 콘텐츠를 끌어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푹은 장기적으로 콘텐츠 홀더(제작사)들을 위한 인프라를 꿈꾸고, 콘텐츠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MCN, 독립 프로덕션 등 전문적인 제작 시스템을 갖춘 곳은 어디든 충분히 제휴해 수익을 공유하도록 할 것”이며 “콘텐츠 발굴과 함께 네트워크 인프라도 끊임없이 발전시켜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다. ‘푹’의 상생 구조가 향후 국내 미디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