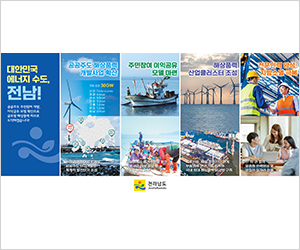고용공시제는 도입 당시부터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과도한 경영간섭 때문이다. 기업 망신주기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잖아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도를 더 높였으니 부작용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간접고용에 한해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면 경영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성도 있다. 아웃소싱 의존도가 높은 정보기술(IT) 기업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으로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저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자율적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2014년 첫 공시 이후 직접·간접고용 비율은 8대2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되레 증가했다.
정부는 이도 모자라 조만간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할 모양이다. 임금 차 줄이기를 겨냥한다지만 이 역시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경영간섭일 따름이다. 어떤 정책이든 목표 달성 못지않게 수단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짝 효과는 낼지언정 지속 가능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정녕 기업을 압박하고 망신을 줘 정규직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