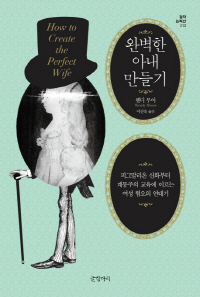삶이 글말로 기록되는 것은 특권이었다. 적어도 한 세기 전까지. 묘비에 글자 하나 새기지 못하고 죽어간 하류층 영혼들은 재판이나 수형 기록이 남은 죄인이 되지 않고서야 삶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상류층 여성들조차 기록은 쟁취해야 할 특권이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예술가의 뮤즈가 되어 종잇장 속에 힘겹게 살아남았다.
여기, 기록되지 않았거나 타인에 의해 비틀린 삶의 기록만 남긴 채 떠나간 여성들의 삶을 복원한 여성 작가들이 있다. 이 복원 작업은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보다 힘겹다. 당대에 가치를 인정받았을 삶이라면 그리 묻히지도 않았을테니.
영국 귀족과 의학의 역사를 다루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웬디 무어는 ‘완벽한 아내 만들기’에서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반노예제 운동가, 인기 아동도서 작가였던 토머스 데이(1748∼1789)의 삶에서 사브리나 시드니라는 무명의 여성을 건져 올린다. 이 과정에서 흑인 인권을 주창한 진보적 지식인이자 빈민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데이가 실상 심각한 여성혐오에 빠져 있었으며 비뚤어진 여성관에 부합하는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 나머지 11살, 12살의 고아를 데려다 이상형에 부합하는 아내감으로 키워내는 반인권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을 폭로한다. 사브리나는 이 프로젝트의 희생양으로, 뜨거운 왁스를 피부에 떨어뜨리거나 총으로 치마를 쏴도 놀라지 않아야 하는 학대나 다름없는 훈육을 이유도 모른 채 감내해야 했다. 법적으로 독립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당시 여성들의 삶을 감안하더라도 데이의 실험은 명백하게 반인권적이었다. 그러나 정치인이자 교육자 리처드 러벌 에지워스, 과학자 이래즈머스 다윈, 여류 작가 애나 수어드 등 저명한 그의 주변 인물들조차 실험을 방관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자기 삶을 지켜낸 것은 사브리나였다. 데이와 결혼을 거부한 사브리나는 학교 교육을 받으며 자기결정권에 눈을 뜨게 됐고 훗날 한 명문가의 집사로, 자선단체와 학교 운영을 도우며 진정한 교육혁신에 가담한다.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 고아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던 사브리나의 삶은 당시 발간된 타인의 자서전이나 소설 속에 실마리를 남겼을 뿐 무어의 집요한 취재가 이어지기 전까진 암흑 속에 묻혀 있었다. 고아원에 버려지면서, 데이를 만나면서, 이후 결혼과 사별을 통해 수차례 이름이 바뀌었던 그녀의 삶을 저자는 수백 년 전 고아원 기록부에서, 교구 세례 장부에서, 글씨조차 알아보기 힘든 묘비명에서, 사브리나 초상화의 진품까지 찾아가며 그러모아 소설 같은 논픽션으로 생생하게 빚었다.
감춰진 여성들의 삶을 찾아 나선 또 한 명의 여성 작가는 문학잡지 편집장이자 서평가인 제사 크리스핀이다. 자살 시도에 실패한 저자는 세상에 맞서 탈주한 여성들, 박제된 남성성에 맞서 싸운 남성들의 발자취를 따라 방랑길에 오른다. 저자가 써내려간 아홉 인물과 도시의 기록은 기록되는 삶이 아닌 기록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분투다.
아일랜드 골웨이에서는 누군가의 뮤즈가 되기엔 너무나 주체적이었던 여성참정권 운동가 모드 곤을 만난다. 평생 ‘천재 시인 윌리엄 예이츠의 청혼을 거절한 혁명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지만 단 한 번도 예이츠가 시어에 품어놓은 환상대로 살지 않았던 모드 곤을 통해 신념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배운다. 트레에스테에서는 천재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아내이자 뮤즈, 원곡은 사라진 채 조이스의 편곡 속에만 살아남은 노라 바너클의 풍화한 삶에 이입한다. 저자는 “아내가 예술가의 뮤즈이고 그의 말을 받아 적는 사람일 때, 아내가 예술의 촉매이자 산파일 때 우리는 그녀를 사랑한다”며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중략)…보수를 주는 직업을 찾으라고 종용할 때, 술 마시고 깽판을 친다고 집 밖으로 쫓아낼 때 우리는 그녀를 미워한다”고 말한다. 결국 예술가의 아내에 대한 우리의 가혹한 시선은 노라의 삶을 지웠다.
교사이자 청소년 소설가인 수전 캐멜 바톨레티가 ‘위험한 요리사 메리’를 통해 소개하는 메리 멜런은 여성,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게 드리운 혐오의 그림자가 낳은 또 다른 희생양이다. 20세기 초 미국 뉴욕에 이민 온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인 메리는 상류층 부인들 사이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 난 요리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24명의 장티푸스 환자를 만들면서 ‘장티푸스 메리’라는 오명 속에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당시의 의학지식으로는 밝힐 수 없었던 ‘건강보균자’였던 메리는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는 보건당국과 경찰, 여성 이민 노동자를 마녀로 전락시키기를 즐겼던 옐로 저널리즘의 협공에 시달렸고 26년간 격리 병동에 유폐된 채 삶을 마감했다. 문제는 장티푸스 집단 발병을 일으킨 남성 건강보균자들은 메리처럼 신문에 실명과 사진이 보도되지도 않았고 격리 조치 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세 책의 저자들이 건져 올린 것은 이름을 가진 여성들의 삶이자, 이들의 이름을 지워 내려간 여성혐오의 역사다. 지난한 여성혐오의 연대기를 한 사람의 불행이나 기행, 만행 따위로 제쳐놓지 않는 이들의 손에서 역사는 바뀐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