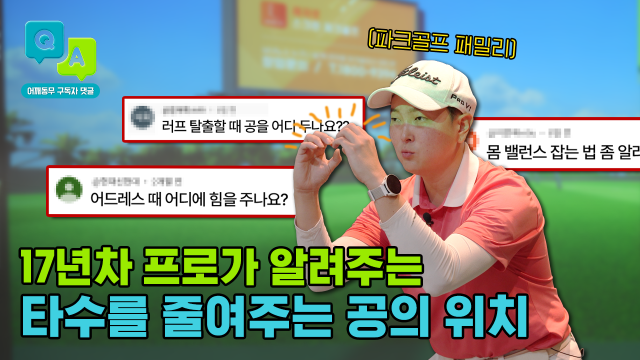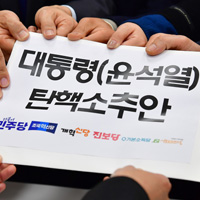“차라리 암이었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을 옭아매는 병이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순례(67·가명)씨는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던 날을 잊지 못한다. 나이 탓에 건망증이 조금 심해졌다고만 여겼는데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는 결과를 받았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증세를 보인 김씨를 병원으로 이끈 것은 같이 등산을 다니는 산악회 회원들이었다.
동네 보건소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덕분에 김씨의 증상은 다행히 악화되지 않고 있다.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여전히 주말마다 산에 오른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김씨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어느 집보다 화목했던 가정이 풍비박산 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씨에게 치매보다 무서운 것은 경제적 부담이다. 매달 200만원에 이르는 간병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버거워 남편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갖고 있던 차량도 팔았다. 올해 초에는 결혼을 앞둔 큰아들이 파혼을 맞았다. 김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치매 환자라고 솔직하게 밝힌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조금씩 용돈을 보내며 안부를 묻던 자식들도 이제는 연락조차 뜸하다.
김씨는 “내가 살아온 기억을 서서히 잃어버린다는 것도 슬프지만 나로 인해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게 가장 힘들다”며 “차라리 암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증 치료까지 같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치매에 걸리는 노인이 급증하면서 국내 치매 환자는 70만명을 넘어섰다. 12분마다 한 명꼴로 치매 환자가 발생해 앞으로 5년 내 전체 환자 규모는 울산광역시 인구에 맞먹는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뒤늦게 치매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다수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제도적 관심과 사회적 배려가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동영 서울대병원 치매클리닉 교수는 “다른 질병과 달리 치매는 환자 본인도 고통을 받지만 환자 가족의 삶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질병의 관점에서 치매를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