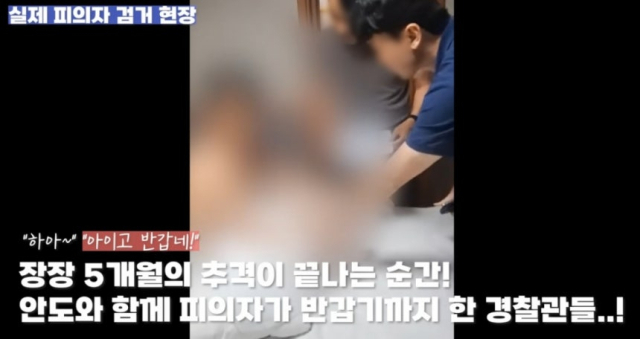‘문화재(文化財)’ 명칭이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된다. 일본의 법령을 그대로 가져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이후 60년만이다. 명칭과 함께 분류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조사, 심의하는 기구인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두는 개선안을 이날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문화재’의 ‘재(財)’라는 표현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 사람을 칭하는 무형문화재나 자연물을 가리키는 천연기념물과 명승(경관)까지도 문화재로 부르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결정적으로는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체계가 서로 달라 연계성이 떨어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돼 있다.
지난 3월 문화재청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 전문가 91.8%로 나왔다.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했다. 통칭 용어로 '국가유산'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 87.2%, 전문가 52.5%가 동의했다.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재 명칭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면서 “국가유산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와 연계시킨 것은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세계유산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비롯해 주변국의 역사왜곡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은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유네스코 협약은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에는 국보·보물·사적·민속문화재가 포함된다.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아우른다. 무형유산은 무형문화재를 의미한다. 지정·등록문화재 명칭도 기존 ‘문화재’가 ‘유산’으로 변경되므로 기존의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재는 ‘국가민속유산’, 등록문화재는 ‘등록유산’ 등으로 바뀐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에는 ‘목록유산’ 개념이 신설된 전망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걸터앉아 논란이 된 북악산 탐방로 내 법흥사터 초석도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목록유산’ 개념을 적용하면 비지정문화재 중 보호가치 있는 향토유산으로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라는 용어개선과 함께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관련 기관 명칭 뿐만 아니라 개별 문화재 안내판 등이 줄줄이 바뀌어야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문화재 안내판 교체비용으로 약 49억원, 교과서 수정 비용 1억8000만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재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분류체계 개선안을 반영한 ‘국가유산기본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