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텍사스는 좋은 파트너지만 애리조나가 더 경쟁력이 높다고 자부합니다. 피닉스에는 인텔과 TSMC를 비롯해 수백 개의 공급 업체와 대학이 있으니까요. 피닉스는 세계 반도체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카일 스콰이어 애리조나주립대(ASU) 공과대학 학장은 미국 내 반도체 ‘경쟁지’인 텍사스를 언급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근거는 있다. 텍사스와 오스틴은 ‘실리콘힐즈’로 불리는 테크 성지인 동시에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이어 테일러 팹 확장에 나서며 지역 대학과의 연계 역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애리조나·ASU·인텔·TSMC의 ‘강력한 연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전반적인 평가다.
가장 큰 장애로 물리적 거리가 꼽힌다. 삼성전자의 대학 파트너인 텍사스 A&M과 삼성전자 공장 간 거리는 120㎞에 달한다. 서울~천안 직선거리나 다름없다. 대학과 공장 사이는 사실상 허허벌판이다. 도시와 대학 캠퍼스, 팹이 하나로 녹아 있는 피닉스·ASU·인텔을 비교하면 물리적 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인력풀도 아쉽다. 삼성전자 테일러 팹이 들어서는 테일러 시의 경우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다. 오스틴 광역권 인구는 250만 명가량으로 500만에 이르는 피닉스 광역권의 절반 수준이다. 외국 기업인 데다 미국 내 산학 연계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의 시작점이 더 불리한 셈이다.
반도체 파운드리 3사 중 미국 내 인력 전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인텔이다. 인텔은 45년 전인 1979년 애리조나에 진출한 터줏대감이다. ASU와 손잡고 인재 육성에 나선 지도 20년이 넘었다. ASU는 단일 대학 중 인텔 직원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그레이스 오설리번 ASU 부총장은 “인텔과 ASU는 연구 자금과 장학금 후원은 물론 반도체지원법 지원금 획득 과정까지 오랜 시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텔의 지역 협력은 애리조나에 국한하지 않는다. 인텔은 ‘실리콘 포레스트’로 불리는 오리건주와 1974년부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인텔은 오리건에서 초중등 교육부터 전문대·4년제를 아우르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구 등을 만들며 공학적 사고를 내재화하고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실습을 통한 직업 학습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는 식이다.
4년제 졸업생만을 고집하지도 않는다. 인텔은 오리건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2주간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까지 이 코스를 통해 인텔로 채용된 인원만 100여 명에 달한다. 전문대를 거쳐 채용된 인력이 현장 경험을 쌓은 후 4년제 학위를 따면 된다는 유연한 사고방식 덕이다. 인텔은 “대학 연구 프로그램, 인턴십 및 장학금 기회, 커리큘럼 개발 관련 자원 등을 통해 인력 개발을 지원하고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채용 후 교육은 미국 테크계에서는 과거부터 흔한 일이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 또한 직업전문학교 졸업 후 인텔에 취업했고 이후 4년제 대학인 샌타클래라대와 스탠퍼드에서 각각 학사·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벌과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본위 인재 육성의 ‘DNA’다.
삼성전자가 인텔·TSMC 등과의 경쟁 속에서 미국 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가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지역 대학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UT 오스틴에 370만 달러, 텍사스 A&M에 100만 달러의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 기업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축적하지 못한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협력만이 답”이라며 “학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방·주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등 합법적인 스킨십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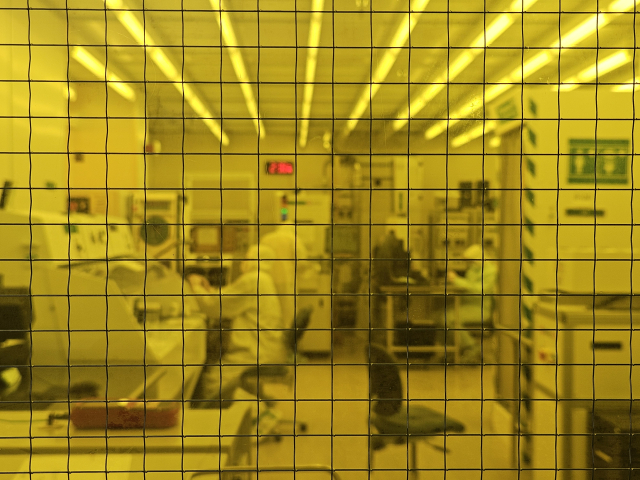
 beherenow@sedaily.com
behereno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