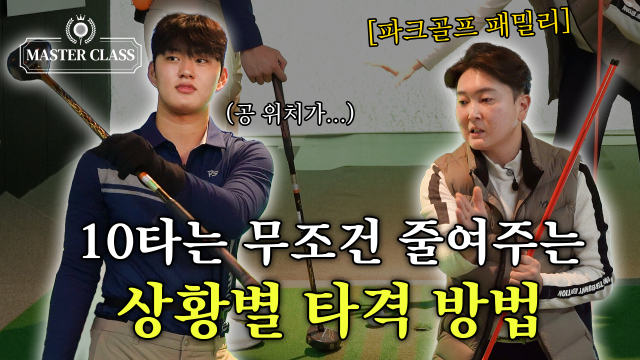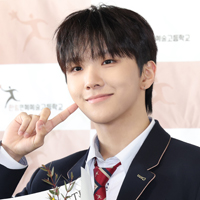국내 의약품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의약품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도와 중국산 원료의약품 수입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쏠림 현상마저 나타났다. 미중 갈등과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해 이미 일부 의약품은 원료를 구하지 못해 품절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여기에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까지 더해져 인도·중국 현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어 정부와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원료의약품(D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545개 중 인도산이 240개, 중국산이 152개로 전체의 72%를 차지해 70%를 웃돌았다. 1년 전인 2023년 두 국가에 대한 원료의약품 수입 비중(69%)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에서 제조한 원료의약품 비중은 지난해 11.7%로 겨우 10%를 넘겨 전년(9.8%)보다 높아졌지만 2017년 17.4%, 2018년 21.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다.
의약품 원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현지 사정에 따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약품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림제약의 통풍 치료제 ‘유리논정’ 은 원료 부족에 따른 품절 상태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 외에도 건일제약의 항생제 ‘아모크라주’, 화이자의 소아 항생제 ‘지스로맥스’ 등도 원료 수급 차질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약품 원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면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이달부터 시행했지만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국내 의약품 원료 생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약가 우대 정책만으로는 국내에서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약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극소수”라며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약품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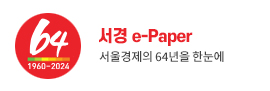





 haena07@sedaily.com
haena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