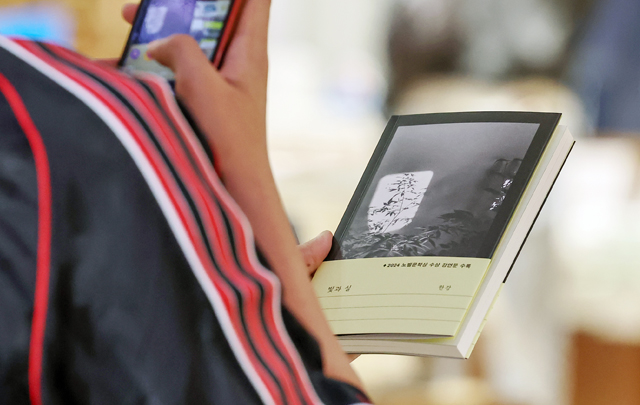3년 만에 다시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치권력의 교체이며 뒤이어 행정부의 조직 개편과 구성원 교체도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를 실행하는 새로운 AI·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편 부처의 장관은 부총리직을 겸임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현 과기정통부 장관도 AI·바이오·양자 등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부처를 신설하고 이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두 입장은 방송 분리 여부는 다르나 과기정통부가 AI 정책을 총괄하면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쟁점은 AI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다. AI 기본법 소관 부서인 과기정통부가 AI 주무 부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고 해서 바로 AI 비전 제시와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다. 이에 걸맞은 AI 관련 기획 예산 기능과 규제 혁신 기능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총리급 부처라는 것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결국 AI를 기반으로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 예산, 규제 개혁, 정부 혁신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AI 외에도 모빌리티·법률·의료 등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혁신도 추진하는 ‘AI 디지털혁신부(가칭)’ 설치를 제안한다.
다음 쟁점은 방송 정책·규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크게 보면 기존 방통위의 방송 정책·규제 기능을 모두 과기정통부로 이전하되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위원회’ 형태로 두는 방안과 과기정통부의 유료 방송 정책 기능과 방통위의 기능을 통합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6년 이상 이어온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여야 간 갈등으로 행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어떤 안이든 통신·미디어 등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정책에서 정치적 쟁점이 된 공영방송을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가 AI·디지털 혁신 분야를 선도할 수 없다면 한국은 AI 소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이 어려운 ‘기술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거버넌스의 통합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면서도 면밀한 AI·디지털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