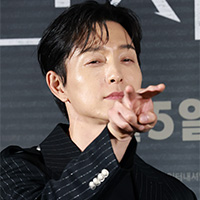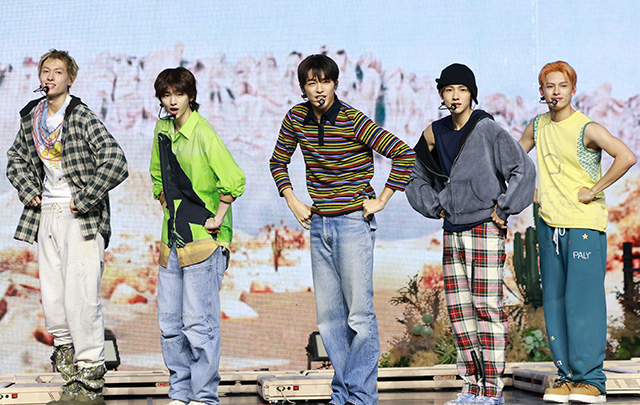독일 출신의 미국 약리학자인 오토 뢰비(1873∼1961)는 꿈에서 암시를 받아 뇌의 활동이 신경전달물질(화학물질)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했다. 그는 이 공로로 1936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인간의 뇌에는 약 1000억개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있는데 이 뉴런사이에 매우 작게 벌어진 틈새가 있다. 이 틈새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뉴런 사이에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매개가 되어야 한다. 당시까지 과학자들은 신경세포사이에 정보전달은 오직 전기적 작용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었다.
뢰비는 1921년(1920년이라는 기록도 있음) 부활절 전날 밤까지 관련 연구를 미루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다. 미주신경(뇌에서 시작하여 안면, 심장 등을 거쳐 복부에 이르는 신경)이 흥분하면 심장박동이 느려지게 된다. 그런데 꿈에서 그는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는 어떤 신경전달물질이 매개체로 작용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뢰비는 깨어나서 그 꿈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다음날 밤 그는 같은 꿈을 한번 더 꾸게 된다.
다음은 뢰비가 기록한 글이다. “나는 깨어나서 불을 켜고 조그맣고 얇은 종이조각에 약간의 메모를 해 두었다. 그런 다음 다시 잠을 잤다. 아침 6시에 간밤에 내가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적어두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나는 이 휘갈겨 쓴 것을 판독할 수 없었다. 다음날 새벽 3시에 또 한번 그 생각이 났다. 그것은 17년 전 내가 언급하였던 화학적 전도에 대한 가설이 옳은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설계였다.”
뢰비는 나이트캡과 가운차림으로 당장 실험실로 내려가 그날 꿈에서와 똑같이 개구리 심장에 관한 실험을 재연해 보았다. 생리식염수를 담은 작은 용기에 따로 분리된 채 계속 뛰고 있는 개구리 심장의 미주신경을 전기로 자극하는 실험이었다. 한 마리 개구리 심장에 전기자극을 몇 분간 가하고 나서 인큐베이터의 액체를 다른 개구리의 심장이 들어있는 용기에 부어보았다. 그러자 그 심장에서도 곧바로 박동 리듬이 느려졌다. 뢰비는 이 실험을 통해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그 말단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그 물질이 용액 속에서 퍼져나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가 발견한 이 신경전달물질은 나중에 ‘아세틸콜린’으로 명명됐다. 뢰비의 실험으로 뇌에서 신경세포간 정보 전달이 전기적 접촉인지 아니면 화학물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 끝을 맺었다. 즉 신경전달물질이 뇌의 시냅스간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개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발견으로부터 신경과학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당초에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뢰비는 뇌에서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커다란 공헌을 하게된다.
연구몽이나 창작몽은 뢰비의 꿈과 같이 현실에서 풀리지 않았던 미해결 과제나 창의적인 생각이 그대로 투시되거나 암시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꿈이다. 연구몽이나 창작몽은 신경생리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였던 앨런 홉슨은 이렇게 말했다. “꿈을 꾸는 것은 가장 창의적인 의식 상태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인지적 요소가 무질서하게 즉흥적으로 재결합하면서 정보의 새로운 배열이 일어난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이다.” 수면 중에 계획·조절·검증 등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대체로 쉰다. 이때 기억이나 정서를 담당하는 변연계나 무의식을 담당하는 부위가 엉뚱한 발상을 하거나 상상력을 거침없이 발휘하게 되면 이같은 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꿈을 꾸는 렘(빠른안구운동) 수면은 사람의 뇌간(뇌줄기)의 특정 부위가 각성되면서 시작된다. 이 때 뇌간에 있는 중간뇌교피개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아세틸콜린은 뇌에 저장된 기억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렘수면 때에는 생생하고 기묘한 꿈을 꾸거나 낮의 경험이나 기억의 파편들이 재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아세틸콜린이 렘수면시 꿈의 시작을 알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현대인은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전달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뢰비가 발견한 아세틸콜린이 제대로 방출되지 못하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1911~2004)은 퇴임 후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알츠하이머는 뇌세포가 점점 손실되면서 그로 인해 이차적으로 기억력이나 판단력, 계산력과 같은 지적 능력이 감퇴해가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대뇌 피질의 콜린계 화학물질의 활성이 감소된다. 콜린계의 대표적인 신경전달물질이 아세틸콜린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