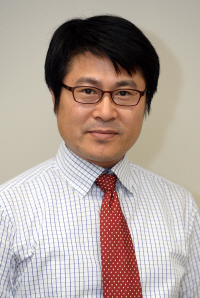|
제6회 지방선거 투표일이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도입된 지 꼭 20년이 됐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누구누구를 뽑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엿한 성년이 된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기에 접어든 것을 가늠하고 앞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 의미도 있다.
시·군·구 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은 우리의 재산과 안전을 대신 책임지는 대변자다. 특정 기간 우리의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치러진 선거에서는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지역의회 의원, 교육감 등 입후보자 8,903명이 국민의 준엄한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내 지역구에서 누가 나오는지도 모른 채 투표장에 가는 것은 주인된 권리를 내팽개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 사회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면서 선거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한 탓도 있다. 또 7장이나 되는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모든 입후보자의 경력이나 철학도 제대로 모른 상황에서 표를 던져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깜깜이 투표'의 후과는 앞으로 우리들의 생활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우리는 4년 동안 피 같은 세금으로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선거 참여율 자체가 너무 낮다는 데 있다. 지자체 부활 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 치러진 지방선거 투표율은 실망스럽다. 부활 첫해인 1995년 68%에 달한 것을 빼놓고서는 이후 4회 모두 50% 초반대의 투표율에 그쳤다. 40%대로 추락한 적도 있다. 사실상 국민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나몰라라 한 셈이다. 깜깜이 투표 못지않게 반쪽짜리 선거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요즘 우리는 투표권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서인지 무덤덤하게 여기는 유권자도 상당하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되돌려본다면 투표행위에서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근대적 의미의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948년 보통선거 제도가 도입된 후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투표의 효시는 지금으로부터 58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세종시대다.
1430년 세종대왕은 농지세 개편을 위해 5개월 동안 전국의 17만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첫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당시의 처지로서는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국민의 뜻을 직접 듣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는 일회성에 그쳤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현명한 군주로 꼽히는 세종대왕이 최대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했던 결과물이라는 데서 의미는 작지 않다. 오늘 투표소에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유권자라면 한번쯤 되새겨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투표는 결국 정치권력이든 행정권력이든 간에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행위다. 그리고 권력층을 향해 외치는 국민의 소리가 클수록 그 효과는 더하다. 오늘 국민의 울림이 얼마나 퍼져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hanu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