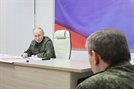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
중국 대형은행 투자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월가 은행들의 손 털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바젤Ⅲ가 도입되는 등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 은행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며 '제 코가 석자'인 월가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중국 경기둔화로 금융권 부실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월가 은행들의 '셀 차이나뱅크' 움직임에 불을 지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전날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건설은행(CCB)의 잔여지분 1%를 20억달러에 홍콩 증시에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BoA는 지난 2005년 30억달러에 CCB 지분 10%를 사들인 뒤 2008년에는 70억달러를 추가 투자해 지분을 20%로 늘렸다. 하지만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분 19%를 226억달러에 매각했다.
중국 금융기관 지분을 서둘러 팔아 치우는 것은 BoA뿐만이 아니다. 골드막삭스는 올 5월 중국 최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의 남은 지분을 11억달러에 전량 매각했다. 지난해 씨티그룹 역시 9년째 보유해온 상하이푸동개발은행 지분을 팔아 3억4,900만달러의 세후이익을 남겼다. 홍콩계인 HSBC도 올 2월 핑안증권 지분 15.6%를 94억달러에 전량 매각했다. 유럽계인 스위스 UBS와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도 2009년 중국은행(BOC) 지분을 전량 팔아 치운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지난 10년간 서구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장기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형은행 지분을 인수했지만 금융위기를 맞아 이 같은 유행도 막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가 은행들이 앞다퉈 중국 투자에서 발을 빼는 것은 무엇보다 투자ㆍ신용 증가에 의존해 성장해온 중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섀도뱅킹(그림자금융) 등 금융부실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중국 경제 연례보고서'에서 부실한 금융 시스템, 지방정부 채무 부실, 부동산 거품,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등 4대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오는 2018년부터 4%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중국 금융권은 잇달아 이상신호를 보내는 상황이다.
CCB의 경우 올 상반기에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 규모가 53억8,000만위안(8억7,900만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7,000만위안의 4배 규모다. 상푸린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장마저 최근 은행 부문의 위험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로이터는 "중국 은행들은 경기성장 둔화와 부실채권 증가의 여파로 자산매각을 통한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ㆍ유럽계 은행들이 중국 금융기관들이 더 부실화하기 전에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의 규제강화나 경쟁격화로 중국 투자의 환상이 깨진 것도 또 다른 이유다. 당장 기업공개(IPO)만 예로 들더라도 중국 은행들에 밀려 월가 은행에는 자주 기회가 오지 않지만 그나마 계약을 따더라도 수수료 후려치기 등 불리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기대만큼 사업기회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 은행 지분가치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차익실현 욕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BoA의 경우 CCB 주가가 올 들어서만도 4.7%가량 떨어졌지만 지분매각으로 총 156억달러의 세전이익을 거뒀다. 골드만삭스의 ICBC 투자수익도 73억달러에 이른다. JP모건증권의 존 클라젝 애널스트는 "중국 정부가 과잉설비 산업에 대한 대출을 조이면서 중국 은행의 이익은 앞으로 3년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월 바젤Ⅲ 시행을 앞두고 은행의 건전성이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커진 것이 중국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홍콩 소재 미즈호증권의 제임스 안토스는 "바젤Ⅲ 때문에 글로벌 은행들이 소규모 지분을 여기저기서 사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 대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2018년 1월까지 국제기준인 바젤Ⅲ의 3%보다 2%포인트 더 높은 5%까지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