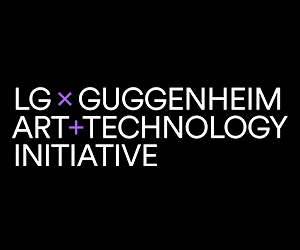|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투기등급의 부실계열사 회사채를 인수ㆍ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10월24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동양그룹의 회사채 사건이 터지자 그동안 뭘 했냐는 질문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공식 답변이다.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동양그룹이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얘기다. 적절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동양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규모가 1조원을 넘어 이들 상품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개정안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대한 금감원의 대답이다. 이해가 된다. 오히려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두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 개정안을 당장 시행했다면 지금의 사태가 4월에 났을 테니 말이다.
문제는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금감원은 뭘 했냐는 것이다.
금감원의 변은 이렇다. "동양그룹의 경우 금융회사 신용공여 잔액이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1%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권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을 통해 그룹의 재무상태를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옹색하다. 적어도 지금의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고 동양그룹의 회사채ㆍCP 발행을 제한하기 힘들었다면 투자 수요를 억제해나가는 조치라도 했어야 맞다.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틀은 마련해놓고 이를 위한 액션은 취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1층에는 날이 갈수록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하려는 개인투자자들로 넘친다. 대부분이 4월 이후 동양증권 측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투자한 사람들이다. 적어도 금감원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이들에게 "10월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줬어야 한다. 그랬다면 금액으로는 1조2,294억원, 숫자로는 4만2,358명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