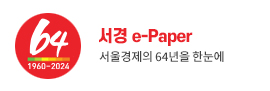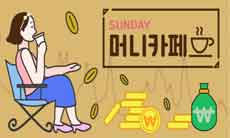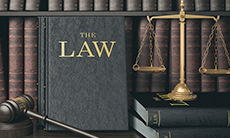특히 직업교육기관의 체계적 운영으로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습이다.
일단 독일은 복선형 교육체제를 갖고 있다. 단계별로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독일 학생들은 4년의 초등학교 과정 후 적성과 능력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중등 1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면 김나지움, 직업교육을 목표로 하면 실업학교 또는 주요학교에 들어가기도 하며 중간 입장인 경우 김나지움ㆍ실업학교ㆍ주요학교의 혼합 형태인 종합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중등 1단계를 마친 후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 김나지움 상급반, 직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직업학교 등 직업교육기관에 진학하게 되고 중등 2단계 졸업 후 필요에 따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다.
직업교육에서는 산업체와 직업훈련의 연계가 잘돼 있다.
이론교육은 직업학교에서, 실습교육은 주로 작업현장에서 이뤄지게 된다.
15~19세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 가운데 12%는 전일제인 직업전문학교, 37%는 김나지움 상급반에서 공부하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제도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있어 효과적인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원적 직업교육 때문이다.
스위스의 직업교육도 복선형 체제를 띤다.
초중교 9년의 의무교육을 마친 15세 이후에 진로가 결정되는데 직업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70~80%에 이른다. 직업으로의 진입 단계가 체계적이고 직업학교를 통한 산업체 기반의 직업교육이 활성화된 덕분에 직업학교 진학률이 높다.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하거나 응용과학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네덜란드는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게 특징으로 꼽힌다. 도제식 직업교육과 학교 기반의 직업교육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등교육기관에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직업교육의 내실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은 독일의 이원화제도를 응용해 학습과 기업 근무를 통한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 3일은 전문학교 등에서 수업하고 주 2일은 실제 기업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식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잡 카드(job card)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업 내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밖에 놓여 있어 트레이닝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시스템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핀란드는 지난 1990년대 초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전통산업 외에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난립하던 직업교육기관을 정리했다.
그 결과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테크닉(Polytechnic)'이 탄생했다.
핀란드는 각 지역의 대학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해 기업과 대학의 거리를 좁힌 과학단지를 육성하고 기업 인턴교육 강화 등 직업교육 체계를 변화시켰고 국가경쟁력 최상위권 국가로 거듭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