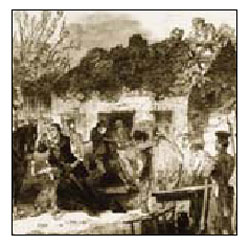|
[오늘의 경제소사/3월13일] 밸린그래스 사건 권홍우 편집위원 1846년 3월13일, 아일랜드 서부 밸린그래스. 소작농 76가구가 사는 마을을 제49연대 병력이 에워쌌다. 마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울부짖고 남자들이 저항했으나 300여 주민들은 가구도 건사하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 아일랜드 대기근의 와중에서 소작농들을 괴롭힌 강제퇴거가 시작된 순간이다. 주민들이 퇴거 당한 이유는 감자 흉작으로 소작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 연간 수입 4파운드 이하인 소작농을 거느린 지주들이 구빈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규 또한 강제 퇴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금을 내느니 소작농들을 몰아내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대농장을 만들겠다는 지주들의 선택으로 약 30만명이 고향에서 영원히 쫓겨났다. 영국인 부재지주 중에서 소작인들을 축출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뿐이었다. 강제 퇴거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 정도로 영국인들은 아일랜드인을 괴롭혔다. 지주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만든 밑바닥에는 민족적 우월감과 맬서스주의가 깔려 있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빈민가를 더 좁고 더럽게 만들어 전염병이 돌도록 유인해야 한다’던 경제학자 맬서스식 사고로 영국인들은 ‘열등민족 아일랜드인’의 불행에 눈을 감았다. 영국의 외면과 대기근으로 아일랜드 인구는 단 5년 동안 900만명에서 66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최소한 150만명이 굶어 죽었다. 아일랜드는 요즘도 영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긴다. 기근과 강제 퇴거도 과거사에 머물지 않는다. 지구촌의 농업생산력은 인구 120억명을 먹여 살릴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기아에 허덕인다. 질병퇴치 노력과 자선은 비난 받아야 할 행위라고 강조한 맬서스주의 역시 건재하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 입었을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