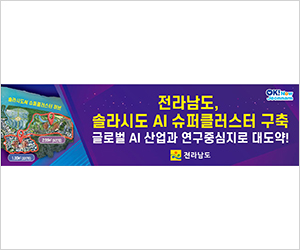|
20여년간 전통염색법 재현해 낸 작가 김정화
“전통은 일상으로 스며들어야 계승ㆍ발전됩니다. 색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 자연친화적인 전통염색의 특징ㆍ장점을 제대로 살려낸다면 우리 상품을 명품으로 키울 수 있는 기본 바탕이자 마지막 포장이 될 것입니다.”
전통염색법으로 자연을 묘사하는 김정화(56ㆍ사진)작가는 예술가에 앞서 20여년간 염장(染匠)의 길을 먼저 걸었다.
학계가 중심이 돼 전통색채의 표준화와 전통염색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는 “장인의 지혜가 반영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론 연구에 현장 노하우를 반영한다면 시행착오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현장의 노하우를 강조하는 데는 1976년부터 경북 영천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시골 어르신의 전통 염색법을 기록한 채록자료집을 내고 고서를 뒤져 옛방식 그대로 염색 공정을 반복한 그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김 작가는 “전통 염법(染法)은 일제 강점기에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게 쪽물염법 정도”라면서 “홍화로 붉은색을 대황으로 황색을 낸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전수받은 지혜로 실험을 반복해 얻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구전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규합총서’‘산림경제’‘임원경제’등 고서를 뒤졌다. 오방색(황ㆍ청ㆍ적ㆍ백ㆍ흑)과 사이 색인 오간색(녹ㆍ벽ㆍ유황ㆍ자ㆍ홍)등으로 구분되는 전통색을 재현해 낸다면 어떤 색이든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1988년 본격 염색에 뛰어들었다. 그는 “식물염색은 염료 농도ㆍ재질 그리고 감금질 횟수에 따라 미묘한 색차이가 나지만 정확한 공정은 찾기 어려웠다”며 “당시 기록은 염장이 아니라 식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세말한 기록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패를 줄이는 데는 어르신들에게 전해들은 노하우가 주효다. 그는 야생초화류 204종으로 식물염료를 추출하고, 천연염료의 복합염법과 문양염법을 개발해 냈다.
색 재현이 자유로워진 그는 바다ㆍ산ㆍ태양ㆍ나무ㆍ불 등을 염색으로 화폭에 옮기기 시작했다. 김 작가는 “한 색 위에 다른 색을 덧대는 과정은 정교하고 치밀해야 한다”며 “자칫 초기에 착색된 것이 탈색될 수도 있어 공정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염색법 연구에서 시작된 그의 호기심은 조각보로 옮겨갔다. 김 작가는 “전통 조각보 바느질은 궁중에서 새 천을 잘라 만들던 관보와 서민들이 자투리천을 이어 붙인 민보로 구분된다. 기획에 의해 디자인된 관보는 바느질 법 등이 서양의 퀼트와 닮았다”며 “구성미 등 미적감각에서 우위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한국적인 것을 고르라면 민보가 먼저다. 자투리천으로 구성을 하고 아래 천이 위로 포개져 쉽게 찢어지지 않는 등 선조들의 생활의 지혜가 돋보인다. 더불어 물이 위에서 흐르듯 천을 포개 자연의 이치가 보자기에 스며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염색한 천은 무채색 위주의 천연염색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 빨강색도 채도 명도별로 수십가지가 넘고 파랑색도 심해의 짙은 파랑에서 하늘빛 옥색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작품이 자연에 가깝게 나올 수 있는 것도 20여년간 공들인 천연염색 기법과 공정 연구의 노하우에서 비롯됐다.
그의 작품은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다. 지난 2007년 미국 산타클라라대 드세세이미술관 초대전 등 해외 전시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 작가는 “한 폭에 20여가지 색을 재현해 내는데 20여년이 걸렸으니 그 동안 연구한 염법으로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작업에 나머지 인생을 걸었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