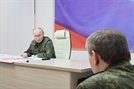|
복권은 서민들에게 인생 역전의 희망을 꿈꾸게 하는 부적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돼지나 용꿈을 꾸거나 길에서 돈을 줍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복권이다. 당첨자가 발표되는 토요일 저녁이 지나면 허탈하게 돌아설지언정 일주일간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현재의 시름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814만5,060대1이라는 극히 희박한 1등 당첨확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매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리라.
△최초의 복권은 유럽의 경우 고대 이집트 또는 기원전 로마시대, 동양에서는 중국 진나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현재처럼 번호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형태는 1530년 이탈리아에서 발행된 '피렌체 로또'가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국가가 전쟁 또는 교회, 항구 등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그 규모는 급속히 확대됐고 지금은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2,458억달러(약 277조원)를 발행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1945년 7월 일제가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 '승찰(勝札)'역시 태평양전쟁 자금 확보가 목적이었다.
△발행 목적이야 어찌됐든 일확천금의 꿈은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서민들에게 구름 사이로 비추는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다. 지난해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1억분의1이 넘는 바늘구멍 확률을 뚫고 2,000억원이 넘는 횡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407억원의 행운을 거머쥐었다는 사실은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박의 미련에 서민들은 없는 돈을 쪼개 매년 6만원씩 복권을 사는 것이다.
△최근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복권의 매출한도를 풀어달라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새 정부 들어 복지재원 확보에 목말라 있는 기재부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 발행 규모가 확대된다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당첨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사행심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은 영 보기가 안 좋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