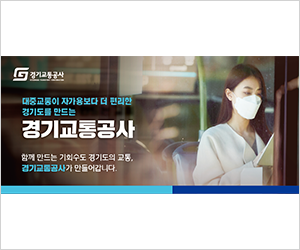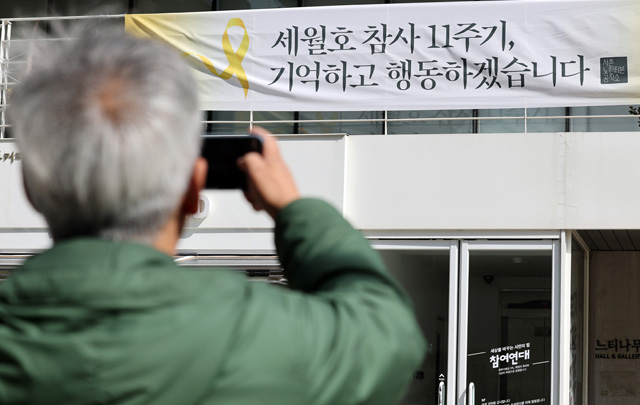|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차기 경제학회장
한국 경제발전단계 마지막 단계 진입
그동안의 발전은 오히려 쉬웠다
진정 기적 원한다면 지금부터 중요
장기저성장 관리실패 일·소 전철 피해야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비효율 정치·사회·문화로 1%성장도 난망
암울한 미래 대비 보이지 않아
경제발전단계설은 해묵은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마도 칼 맑스(Karl Marx)의 것으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전 단계이고 인류의 경제발전은 공산주의로 수렴한다고 보았다. 맑스의 설을 반박하기 위하여 월터 로스토우(Walter W. Rostow) 같은 학자는 새로운 발전단계설을 제창하였으며 그의 도약단계(take-off)는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맑스의 경제발전단계설은 공산주의의 파탄으로 이미 그 설득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형태의 경제발전단계설이 설득력 있는 경제발전이론이 되기 어려웠던 것은 나라마다 경제발전의 패턴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인 생활수준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영국의 패턴이 미국의 그것과 다르고 2차 대전 이후에 경제발전을 이룬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라 불리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패턴과도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2차 대전 이후로만 한정해 본다면 유의한 경제발전의 패턴이 나타난다. 빈곤의 덫에 갇혀 있던, 오랜 낮은 성장률의 단계에서 높은 성장으로의 이행단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20~30년의 고도성장이 일어난 다음 다시 낮은 성장으로 이행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이와 같은 패턴은 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서 처음 나타났고 동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에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패턴은 중국, 그리고 구소련 붕괴 이후 여러 체제전환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위의 경제발전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이행하기 시작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낮은 성장률과 그에 따른 여러 어려움은 이제 우리의 일상사가 되었다. 1970, 1980년대의 활기찬 경제성장을 체험한 세대에게 지금의 이 나라는 아미도 생소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형화된 경제발전단계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기적 같은 경제발전은 어쩌면 쉬운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동안 죽을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헌신하여 이룩한 번영이 거저 얻은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의 고도성장은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경제 환경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적이고자 한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저성장의 장기균형에서는 평균적인 성장률이 중요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소련과 일본의 경험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에는 구소련이,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리라고 예측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은 붕괴됐고 일본의 장기불황은 20년이 넘었다. 소련과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한 나라는 붕괴하고 다른 나라는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 구소련과 일본은 고도성장 다음에 나타나는 저성장 장기균형을 관리하는데 실패하였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이미 단기적 현상인 불황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 일본의 장기균형으로,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균형을 양적완화와 같은 총수요관리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장기균형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장기균형에서는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우리의 지금과 같은 경제 구조에서 이미 눈앞에 다가온 장기균형에서 성장률이 몇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의 비효율과 모순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장기균형 성장률은 몇 퍼센트일까? 추측컨대 3%는 아닐 것이다. 2%, 그도 쉽지 않을 수 있다. 1%? 추측이 이 정도에 이르면 다급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시라. 그 누가 암울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