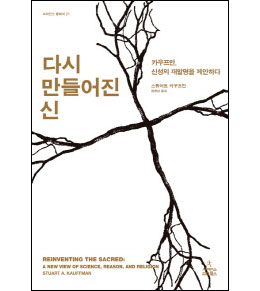|
“환원주의(관찰 불가능한 이론적 개념·법칙을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명제의 집합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 와는 작별을 고해야 한다” 복잡성 과학의 대가인 저자가 책에서 주장하는 바다.
지난달 4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과학자들이 거대강입자가속기(LHC)를 활용한 연구에서 힉스입자로 추정되는 새로운 소립자(素粒子)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힉스 입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에 질량을 부여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 이 실체가 확인되면 질량의 기원에 대한 오랜 의문이 풀리게 된다. 우주 탄생 비밀을 밝힐 핵심 열쇠인 힉스입자의 존재 가능성에 세계 물리학자들은 흥분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생각이 다르다. “자연계의 모든 속성을 자연 법칙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신념이 곧 갈릴레오의 주문이었다. 그러나 현대 과학자들에게 저주처럼 걸려있는 ‘갈릴레오 주문’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환원주의가 과학계에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화의 결과 등장한 행위자와 행위 주체성, 그들이 만들어 내는 행동의 의미와 가치, 풍성한 창발성을 설명하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곧 저자는 환원주의를 넘어 이 창발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저자는 “자연은 법칙의‘지배를 받지만’ 부분적으로 자연 법칙을‘넘어선다’”며 예측 불가능한 창발성과 창조성을 가진 자연에게 ‘신(神)’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자고 제안한다. 빈 공간을 돌아다니며 입자가 일으키는 사건과 사실만이 있는 활기 없고 차가운 우주에 어떻게든 ‘신’을 끼워 넣자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저자는 우리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들, 즉 창조성과 의미, 목적이 있는 행동 등이 사실은 우주의 내재적 속성이며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계몽 시대 이후 현대 문명을 지배해 온 거대한 상처와 분열들, 성(聖)과 속(俗)의 분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분열, 원리주의자와 세속주의자의 분열, 인문학과 자연 과학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구 문명을 구축하는 기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신성을 초자연적인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우주의 자연적 창조성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종교와 과학에 공통 기반을 놓아 주겠다는 저자의 도발적인 생각이 현대 지식 사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종교와 과학을 통섭하려는 저자의 이 거대한 주장은 신선한 생각의 틀을 제공하고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2만 5,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