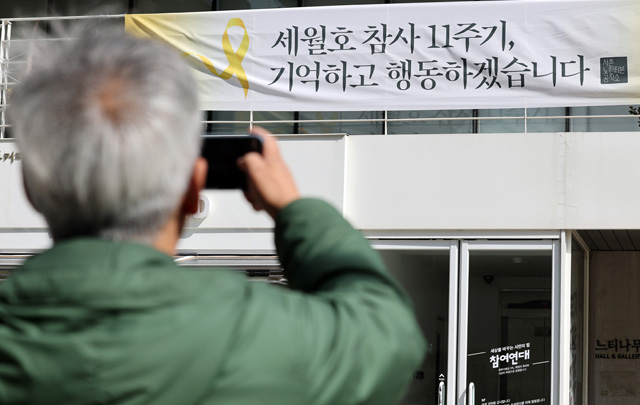|
1967년 외국환전문 국책은행으로 출범한 외환은행(KEB). 개발 시대 외환은행은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직장이었다. 때론 한국은행보다 인기가 높았다. 수출 주도 정책 속에서 외환은행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핏줄'이었고 해외에서는 '가장 유명한 한국 은행'이었다.
그만큼 'KEB맨'의 자부심은 강하다. 은행 이미지 또한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강직하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렸던 아픈 상처만을 기억하지만 흔적을 되짚다 보면 그들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미 있는 '희생양'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은행이 속절없이 해외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팔린 것도 실물 산업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었다. 기자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당시 외환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었던 이연수씨의 애끓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 부행장은 녹내장으로 눈의 핏줄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현대그룹과 하이닉스반도체의 구조조정을 위해 뛰었다.
오늘날 현대차그룹이 세계 무대의 주연이 되고 하이닉스가 SK 품에서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효자 노릇을 하는 것에는 외환은행의 아픈 역사,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직장을 떠난 외환은행 선배들의 희생이 깔려 있다.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의 품에 안긴 후 부활하려 애쓰는 모습에 응원을 하고 그 결과 '2X카드'가 100만장 이상의 판매액을 올리는 모습에 누구보다 먼저 박수를 친 것은 KEB가 걸어온 이런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KEB맨들의 이런 노력은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은행산업은 지금 위기다. 저금리에 수익성은 곤두박질치는데 모바일뱅킹과 정보기술(IT) 업체들의 금융 진출, 여기에 우리금융 민영화까지 겹치면서 금융산업 질서는 요동치고 있다.
금융환경 격변에 홀로 생존 한계
외환은행이 부활을 위해 고통스러운 노력을 펼쳐 왔지만 홀로 싸워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이다. 당장 순이익이 2년여 만에 4분의1토막나지 않았는가. 이런 마당에 힘을 모으지 않고 각개 전투를 벌이는 것은 병사만 죽이는 일이다.
'수사적 표현'이 깃들여 있기는 하지만 "조기 통합은 대박"이라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외침에는 현재 처한 절박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은 외환은행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KEB맨이 하나은행과 통합을 먼저 외칠 때다. 하나금융은 조기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1조원이라고 했지만 역으로 통합이 늦을 경우 그 이상의 '퇴행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 하나금융은 신한금융에 영원히 뒤처질지 모른다. 그나마 KB가 지배구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우리은행이 민영화의 소용돌이에 빠져 '쇠락' 수준을 면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금융 전체가 위험해진다.
물론 KEB맨의 마음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지난 2012년 인수될 당시 하나금융은 분명 5년간의 독립경영을 보장했다. 오죽 불안했으면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까지 입회하도록 했을까. 외환은행 직원들이 조기 합병에 반대하며 광화문 한복판의 금융위원회 앞에 갈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인수합병(M&A)의 처지에 놓여 보지 못한 사람들은 조직원의 서글픈 마음과 불안함을 짐작 못한다.
미래 위해 하나銀과 조기통합 나서야
그렇다고 언제까지 아픈 과거를 안고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노조가 협상 창구에 나서는 것까지 거부하는 것은 8,000여 KEB맨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 과거의 영광을 만들었던,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은행을 떠나야 했던 '선배 KEB맨'들이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다.
현명한 전술은 조직 생존과 조직원들의 실리를 동시에 최적화해서 얻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타이밍'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패는 하나금융 경영진이 아닌 노조가 쥐고 있다. 패를 쥐었으면 꺼낼 줄 알아야 한다.
고용 보장이든, 돈이든, 지금이 바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적기'다. 과거가 현재의 올가미가 돼서는 곤란하다. /yo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