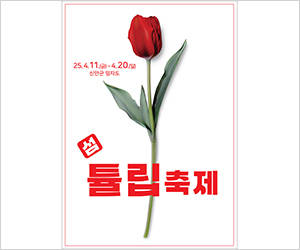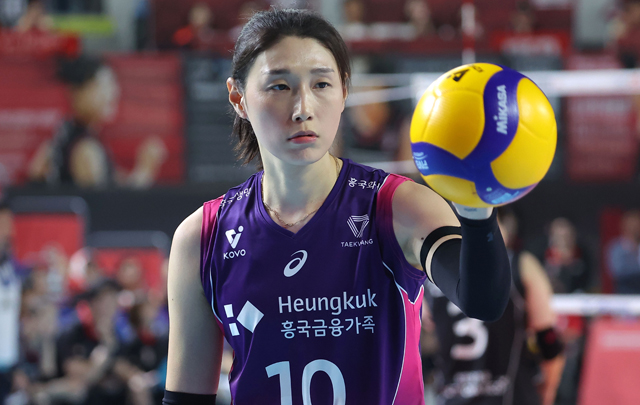|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권과 러시아 간 갈등이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안보외교 정책이 러시아의 도발을 불렀다며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이뤄 놓은 구소련 해체, 유럽 자유화라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최대 외교적 치적이 무력화할 위기라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체스를 두는데 오바마는 구슬치기만 한다"(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였는데도 러시아와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로 일관했다. 뒤늦게 외교·경제적 제재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푸틴은 크림반도 독립 가능성, 우크라이나 서방화 저지 등 실익을 이미 건진 뒤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 때도 군사공격을 운운했지만 최대 우방국인 영국이 이탈하자 의회 비준 절차의 뒤에 숨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오바마는 지난해 11월에도 이란 핵협상을 타결하며 경제 제재를 풀어 공화당의 반발을 샀다.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위상이 퇴보하고 이른바 '불량 국가'들이 미국을 우습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국가부채에 전쟁능력 약화
하지만 과연 공화당이 집권했다면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 지위를 고수할 수 있었을까. 결론은 부정적이다. 단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 이후 깊어진 미국 내 전쟁 염증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16조7,000억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 탓에 미국의 전쟁능력 자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오바마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올해 10월1일~다음해 9월30일)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미 국가부채는 2024년 25조달러로 급증한다. 미 정부의 순이자 지급액만 내년도 2,510억달러에서 2022년 7,610억달러로 늘어난다. 이는 2022년 국방비 지출액 7,450억달러를 웃돌고 사회안전망 비용 1조3,370억달러의 절반보다 더 많은 액수다.
천문학적인 부채는 미 군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6,060억달러로 전년보다 60억달러 깎은 게 단적인 사례다. 2007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 이에 앞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4일 미군을 5년간 20% 이상 줄여 2차대전 이후 최소 규모로 운영하는 방침도 발표했다. 공화당은 "세계 최강의 군대 지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맹비난하지만 뚜렷한 예산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핵심 외교전략인 '아시아 중심축(Pivot to Asia)'에도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카트리나 맥팔랜드 미국 국방부 획득담당 차관보는 최근 "국방 예산감축 등을 감안하면 솔직히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실행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가 해명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미 국방 예산은 여전히 다음 순위 6~7개국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 문제는 다른 나라의 추격이다. 올해 중국은 주변국과 영토 분쟁에 대비해 국방 예산을 1,322억달러(8,082억 위안)로 지난해보다 12.2%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 역시 2016년까지 국방비를 980억달러로 지금보다 40%나 늘릴 방침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는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활공기, 정밀 대함 미사일 등 미 군사력 핵심이었던 최첨단 무기 분야에서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헤이글 국방 장관마저 지난주 "바다와 하늘, 우주공간에서 20년간 이어진 미국의 일방적인 지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더구나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첨단무기 연구개발(R&D) 비용은 20% 이상 삭감됐다.
일본 군사대국화 용인 속도낼 듯
금융패권과 더불어 미국의 양대 세계지배 수단인 군사력이 국가부채 때문에 흠집이 나기 시작한 셈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포기할 리도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소 비용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과 안보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한국 측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choihu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