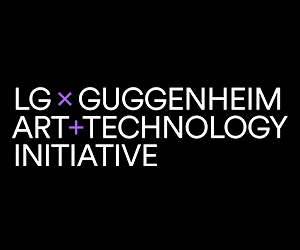이 같은 내홍의 원인은 서로 다른 연줄을 가진 낙하산인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상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다. 하지만 주인 없는 은행에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만들어 정권창출 공신이나 관피아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관치(官治)를 일삼아온 정권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경영 주도권 다툼은 서로 다른 뒷배 간의 힘겨루기이기도 하다. 제재권자인 금융당국까지 휘둘릴 정도다. 더욱 볼썽사나운 이유다.
금융당국은 파장이 만만찮은 사안을 단판에 결론 내겠다고 나섰다가 화를 키웠다. 따지고 보면 전산 시스템 교체 문제를 뺀 징계 사안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에서의 부실한 금융감독과 연관돼 있다. 대통령의 측근들인 '4대 천왕'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감독·검사를 못했던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에 기초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게 순리다. 애초에 천명해온 중징계 방침에 집착해서 무리수를 두거나 외부 입김·로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달 안에는 꼭 징계수위를 결정해 KB금융이 하루빨리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국의 징계수위가 어떤 것이든 임 회장과 이 행장은 KB금융을 엄청난 신뢰의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인 없는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낙하산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그래야 '제조는 일류, 금융은 삼류'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