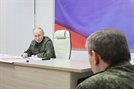그런 차원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 신임 원장의 공직 인생 역전이 새삼 화제다. 진 원장이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하다가 새누리당에 파견된 것은 지난 2012년 7월.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의 기류도 상당히 강했다.
그런 미묘한 시점에 여당 파견을 모두 기피했지만 진 원장은 기꺼이 떠안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했다. 특히 당시 공약을 준비하던 새누리당 대선캠프는 진 원장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진 원장의 겸손하고 성실한 스타일은 당시 대선캠프 공약을 짜던 안종범 현 경제수석의 눈에 띄었고, 현 정권과 인연을 쌓는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 전문위원 경험의 덕을 본 것은 비단 진 원장 뿐만이 아니다. 전임인 최수현 전 원장 역시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경험이 공직 인생의 새로운 발판이 됐다. 임태희 의원 등 당시 맺은 여권 고위 인사들과의 인연을 발판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거쳐 원장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이번 금감원장 인선 이후 금융관료 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엘리트’ 코스가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다는 푸념도 나온다. 진 원장과 최 전 원장 모두 금융 정책 라인의 꽃인 은행제도과장이나 금융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지 못했던 인물이다. 오히려 근면 성실함을 무기로 변방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던 비주류에 가깝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해도 1급 승진이 보장되지 않고 갈 자리도 별로 없는 현실에서 비춰보면 인사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