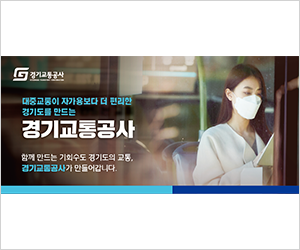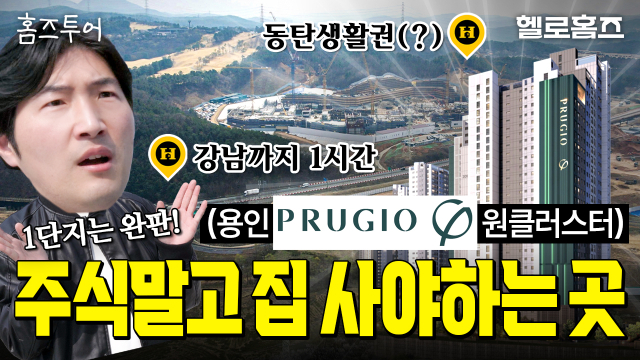|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이 철저히 붕괴되면서 시행사업이 올 스톱됐습니다. 존립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당장 살기 위해서 확보했던 땅마저 모두 처분했습니다. 확보해놓은 토지가 없어요. 내년 이후가 더 막막합니다."
건설ㆍ부동산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가장 처절한 곳은 부동산개발업체(디벨로퍼)들이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활황기에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돈을 쓸어 담던 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대부분의 부동산개발업체(디벨로퍼)가 개점 휴업 중이고 그나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악성 미분양을 떠안은 채 악전고투중이다. 내년에도 PF 시장의 '돈맥경화'가 해소되지 않고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본력이 풍부한 일부 대기업 계열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소속 회원사 209곳 중 올해 신규 사업을 벌인 곳은 20곳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형ㆍ중견 건설사 10여곳을 제외하면 전문 디벨로퍼로서 올해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 등을 신규 공급한 업체는 신영ㆍAM플러스자산개발ㆍ엠디엠 등 5~6곳에 불과하다.
국내 디벨로퍼 1세대를 대표하는 ㈜신영은 올해 청주ㆍ여수ㆍ서울 강남 등 3곳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했고, 애경그룹 계열의 AM플러스자산개발은 분당ㆍ동대문에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신규 분양했다. 엠디엠은 광교신도시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선보였다. 이들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겨우 명맥을 유지하거나 개점휴업 상태다.
부동산개발업계가 이처럼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2008년을 기점으로 건설ㆍ부동산경기가 꺾이면서 발생한 미분양으로 부실이 커진데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PF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돈줄이 말랐기 때문이다. 기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부실을 털어내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신규 개발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다. A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PF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형 건설사가 예닐곱 군데에 불과하다는데 중소 시행사는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틈새상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데는 업계의 잘못도 크다. 활황기에는 '허허벌판에 말뚝만 박아놓아도 사업이 굴러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보니 타당성 검토나 리스크 관리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펼친 결과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본력과 시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도태될 수 밖에 없고, 부동산개발업계도 자연스레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 계열 시행사 중심으로 구조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SK그룹 계열의 SK D&D나 롯데그룹의 롯데자산개발, 애경그룹이 출자한 AM플러스자산개발 등이 활발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부동산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대박을 노리고 한탕주의식으로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지만 견실한 사업실적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디벨로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에 나서는 등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면서 "금융업계에서도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거쳐 될 만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PF 대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M플러스자산개발 '군계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