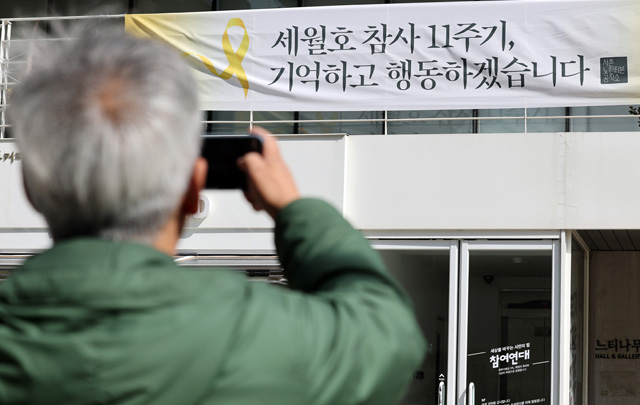가을학기제는 노무현 정부 후반에도 추진됐으나 도입 취지 못지않게 취업, 교육과정 조정 등 시스템 전반을 고치는 데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반론 때문에 무산됐다. 교육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6년여 동안 가을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적한 대로 학령기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교원·학생 등의 인적 자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세를 볼 때 가을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이다.
3∼4월에 시작하는 봄학기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호주·일본과 우리 정도만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제도의 뿌리가 됐던 일본조차 최근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기 인구감소도 심각한 양상이다. 올해 대학 1년생인 1995년 출생자 수는 71만5,000명이었으나 지난해 출생자는 43만6,000명으로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 축소와 학교 통폐합 등으로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외 교육 수요 유치가 불가피하다. 국제사회와의 학기제 적합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가을학기제 이행을 위해서는 부작용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 당장 어느 학년부터 가을학기제를 도입해야 하는지도 큰 숙제다. 제도개선 목표인 국제 인력교류 활성화가 가을학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이 명심해야 한다. 뿌리 깊은 제도를 바꿀 때는 보다 신중한 이행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