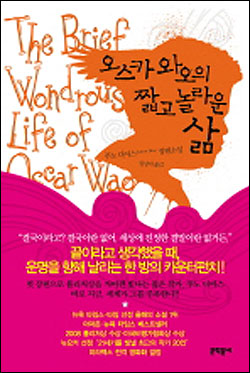|
주인공 오스카는 몸무게가 110kg에 달하는 뚱보에다가 사교성도 거의 없다. ‘혹성탈출’, ‘닥터후’ 같은 SF소설과 드라마에 빠져 사는 ‘오타쿠(어떤 일에 푹 빠져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초등학생 시절 여자친구에게 차갑게 버림받은 뒤 외모도 성격도 바뀌었다. 그는 성장하면서 늘 사랑을 갈구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 그의 머릿 속에 ‘푸쿠(저주)’란 단어가 떠오른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미국 이민자인 그의 가족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엄마 벨라시아는 태어나자마자 친척에게 맡겨져 노예와 다름 없이 자라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군인 출신의 도미니카 공화국 독재자 트루히요에게 밉보여 집안이 몰락했기 때문. 열정적인 사랑을 꿈꾸며 자란 벨라시아는 남자에게 채이길 여러 번. 결국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다. 그녀의 불행한 인생엔 유방암이란 불청객도 찾아온다. 이 또한 피할 수 없는 ‘푸쿠’였다. 저자가 모티브로 삼은 ‘푸쿠’는 유럽인이 신대륙을 침략하며 자행한 파멸과 저주를 뜻하는 말. 소설에서 ‘푸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들의 삶을 좌우하며 의미를 부여한다. 독재자 트루히요, 오스카의 가족 등 언급되는 모든 이들에겐 ‘푸쿠’가 어김 없이 적용된다.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생동감이 넘치고 쾌활하다. 저자는 ‘푸쿠’를 피하는 주문 ‘사파’를 삽입해 묘한 역동성을 불어 넣었다. 1996년 ‘드라운’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일약 스타가 된 저자는 11년의 공백 끝에 이 소설을 내놓았고 책은 지난해 퓰리처상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호평이 쏟아진 이 책은 단순히 엇나간 사랑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각종 사건에는 항상 독재가 남긴 사회 풍경을 은근히 비꼬는 해학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도 사건간의 연결고리는 꽤 튼튼하다. 각종 문학상을 휩쓴 저자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