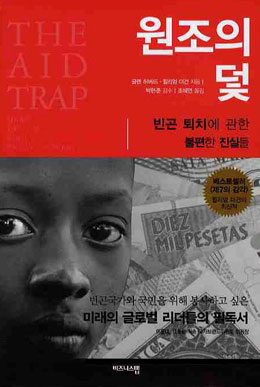|
1960년대, 전쟁 직후였던 한국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1인당 GDP는 약 60만원(환율 1120원 기준)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3,000만원이고 콩고는 40만원 수준이다. 외국의 원조로 버텼던 비슷한 처지의 두 빈곤국이 어떤 까닭으로 80배 가량의 격차를 갖게 되었을까. 이 책은 '원조금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느냐'가 이유라고 주장한다. 한국과 콩고를 비교하면, 한국은 원조금을 민간 부문의 발전에 투자했고 기업설립과 일자리 창출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지난 50년간 수 조 달러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빈곤국들은 아직도 원조가 시작됐던 시기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원조의 덫'이라는 책 제목은 빈곤국에 대한 G8의 외국 원조가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이뤄졌음을 지적한다. G8의 원조금은 민간 산업 부문보다는 빈곤국의 정부나 NGO프로젝트에 지원되고 있다는 게 치명적인 실수이며,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저자들은 얘기한다.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가난한 지역에 공짜로 우물을 파 줄 게 아니라 우물 파는 지역 업체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실질적인 '원조' 활동이다. 그렇다면 원조기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왜 똑같은 착오를 반복했을까. 여기에는 구호활동에 대한 인도주의적 욕구로 인한 '자선의 함정', 구호단체 자체의 사리사욕이 영향을 끼쳤다. 또한 연간 총 5,0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기업활동에 지원할 만한 대체 방안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책은 가장 성공적인 원조 프로젝트로 평가받는 '마셜 플랜(Marchall Plan)'을 살펴보는 데 후반부를할애했다. 마셜 플랜은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에 정부와 NGO 대신 민간부문을 육성을 목표로 원조하는 데 집중했다. 나아가 오늘날의 구호금을 어떻게 산업육성에 사용할 수 있을지 '신(新) 마셜 플랜'을 제시한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원조를 제공하는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으로서 국민총생산의 0.25%를 외국에 원조하기로 목표를 세운 한국. 가난과 기아에서 벗어나 발전을 이룬 한국의 선례가 책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해 흥미롭다. 1만5,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