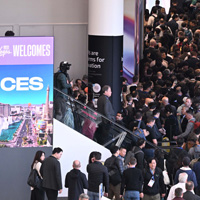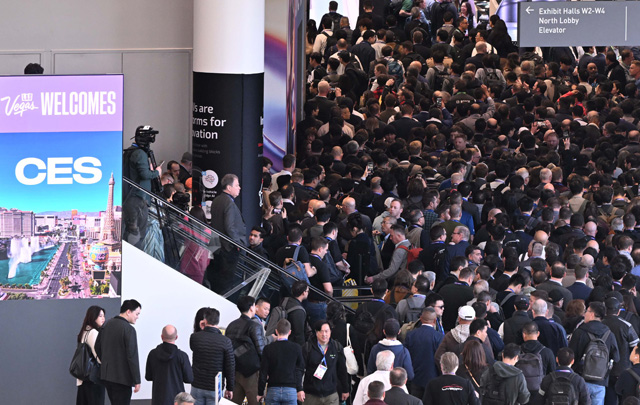하지만 국내에서는 인기는커녕 대표적으로 찬밥 신세인 종목이다. 남녀를 합해도 등록 선수는 700명이 채 안 된다. 약 200만명인 캐나다와 견주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제대로 된 훈련장도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이다. 핸드볼에 이어 컬링에서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을 이룩해냈다. 선수들이 울린 개가는 분명 눈부시고 추앙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른바 '헝그리 정신'의 승리는 한국 체육계에 더 이상 자랑이 아니다. 아니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5위에 올랐고 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위상을 생각하면 사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컬링뿐만 아니라 동계 스포츠 종목 대부분의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스키 점프는 왁싱 전문가가 없어 선수가 경기 전날 밤을 새워가며 스키를 손질하고 썰매 종목은 훈련장이 없어 귀한 시간을 쪼개 외국을 전전한다. 제법 성적을 낸 후 썰매 훈련장이 생겼지만 정식 훈련장이 아니라 출발만 연습하는 스타트 훈련장이다.
체육계나 기업들의 지원이 늘었지만 그나마 국제 대회에서 뚜렷한 성적을 낸 뒤에야 뒤늦게 이뤄진다. 스피드 스케이팅도 밴쿠버 올림픽의 활약이 있고 난 뒤 선수후원 계약 소식이 들렸다.
물론 선수들로서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 설움→국제 대회 상위 입상→반짝 관심'은 전형적인 스포츠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대한체육회의 평창 동계올림픽 목표는 종합 4위라고 한다. 올림픽에서 개최지의 성적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메달 집계로 이뤄지는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양한 종목에서 세계 수준에 근접한 실력을 보이느냐다. 지금도 소외 종목 선수들은 배운 게 노력뿐이라 '맨땅에 헤딩'식으로 땀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막연한 희망을 구체적인 목표로 바꾸도록 돕는 것은 체육계가 할 일이다. 기업들도 스타 마케팅에만 목을 맬 게 아니라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