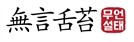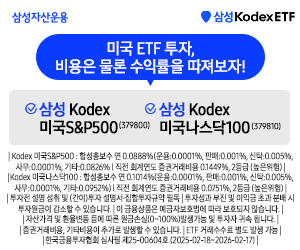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반도체ㆍ핸드폰ㆍTV 등 각종 첨단 정보기술(IT) 기기를 넘어 패션ㆍ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 산업에서도 글로벌 브랜드가 나올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시내 쇼핑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는 외국 패스트패션(SPA) 브랜드의 쇼핑 가방을 든 소비자들의 모습이다. 국내 업체들도 앞다퉈 SPA 브랜드를 내놓으며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들 SPA 브랜드는 세계 각처에서 제품을 생산해 세계 각국의 수많은 대형 직영 매장에서 선보이며 '합리적 가격과 품질'을 구현한다. 이에 비해 국내 브랜드의 경우 생산비 절감 능력, 디자인 파워 등에서 뒤지는가 하면 제조사가 유통을 주관하는 대신 소형 대리점 형태로 운영해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명동 화장품 거리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결을 이루지만 국내를 벗어난 수출 전선의 인기는 아직 미미하다.
다행히 이들 SPA 브랜드의 주역 역시 스페인ㆍ스웨덴ㆍ일본 등으로 패션 종주국이 아니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변방국들은 패션 선진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제조사직유통 브랜드로 나타난 것이다. 스웨덴의 H&M은 높은 자국의 환율을 버리고 중저가를 고집했고, 일본은 기본형 의류로 콘셉트를 정리했다. 결국 주어진 기반 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낼 때 글로벌 브랜드가 창출된다는 얘기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국내 패션인들의 독창성에 세계가 주목하지만 패션 디자이너의 연봉이 국내 산업계에서 낮은 축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며 통탄했다.
문화적 독창성이나 국가 이미지, 품질 등 글로벌화를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전세계를 수놓는 패션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화룡점정'의 전략이 필요한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