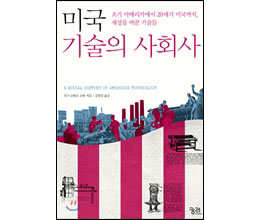|
기술이라는 잣대로 미국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북미 대륙에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17세기부터 20세기말까지 미국기술의 흐름과 그로 인한 사회변화를 그려내고 있다.
저자의 관점은 인간의 복잡한 삶과 역사 그 자체를 '기술사(史)'로 읽을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위해 식민지 미국, 산업화 시대, 20세기 등 미국의 역사를 총 3부로 나눠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용한 도구에서부터 자동차, 컴퓨터, 항공기, 항생제, 피임약,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 등 미국이 발명하고 발전시켰던 미국기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산업화가 노동자와 주부에게 미친 영향 등 광범한 주제와 사례를 다룬다.
저자는 특히 1870년부터 1920년 사이에 나와 미국 산업사회를 뒷받침한 5개의 기술시스템,즉 전신, 철도, 석유, 전화, 전기에 주목한다. 전선을 따라 먼 거리에 메시지를 보내는 진신장치는 미국의 정치와 경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신은 멀리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빠르게 전송했고,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출생, 사망과 같은 중요한 소식들 전달했다. 미국에서 철도는 서로 떨어진 지역들,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연결해준 또 하나의 시스템이었다. 전화의 발명은 전신과 유사했지만 사회적인 의미는 또 달랐다. 전신은 도트와 대시의 배열을 해석해줄 전신기사라는 중개인이 필요했지만 음성통신인 전화는 중개인없이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감정까지도 교류할 수 있었다.
이런 기술시스템들을 등에 업고 진행된 당시 미국 산업화과정은 부의 중심과 정치권력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또 사람들은 '자연에 덜 의존'하게 되는 대신 '서로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했다. 미국민들이 거대하고 복잡한 물리적ㆍ사회적 네트워크 속으로 모두 연결되었고 결국 그 때문에서 자연이 아닌 서로에게 더욱 더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된 셈이다. 기술이 물질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대표적인 사례다.
저자는 건국 직후 숙련노동자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비숙련노동자도 쉽게 만질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강했고, 결국 이런 분위기가 기계화와 산업화를 촉진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책은 기술의 진보가 사람들이 일하고 이동하며, 의사소통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설명하는 기술의 사회사(史)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사회사와 경제사를 엿볼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보인다. 2만8,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