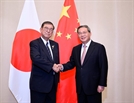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
잇따른 대형건설사들의 실적 쇼크 속에서 대림산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영업익이 30%나 급증하면서 자칫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위기설을 가라앉힌 것. 기존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수주 전략이 수익성을 높인 힘이었다는 분석이다.
대림산업은 17일 올해 1ㆍ4분기 영업이익이 1,2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6억원)보다 30.95%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액도 2조5,160억원으로 지난해 1ㆍ4분기의 2조512억원보다 22.66% 늘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213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5.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대림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매출 2조3,000억원, 세전이익 1,3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GS건설이 5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5,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대림산업 실적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냈을 경우 해외건설의 수익성 문제가 개별 업체가 아닌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주형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며 "대림산업의 경우 타 업체와는 달리 저가 수주에 대한 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림의 보수적인 경영이 오히려 위기에 강한 체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저가 수주를 자제하고 수익성 위주의 안정적인 수주 전략을 편 것이 대림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무리한 신시장 개척보다는 기존 풍부한 실적을 가진 공정에 집중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챙긴 것이 실적의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대형건설사들의 수익성 문제로 떠오른 2009년~2011년 사이 수주한 공사를 보면 대림산업은 사우디아라비아ㆍ이란ㆍ필리핀ㆍ베트남 등 기반이 확실한 지역에서의 수주가 대부분이었다. 기반이 확실한 만큼 신시장 개척에 따른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 요인이 적었다는 것이다.
풍부한 사업수행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성 저하 문제는 설계에서 조달ㆍ시공까지의 공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후발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