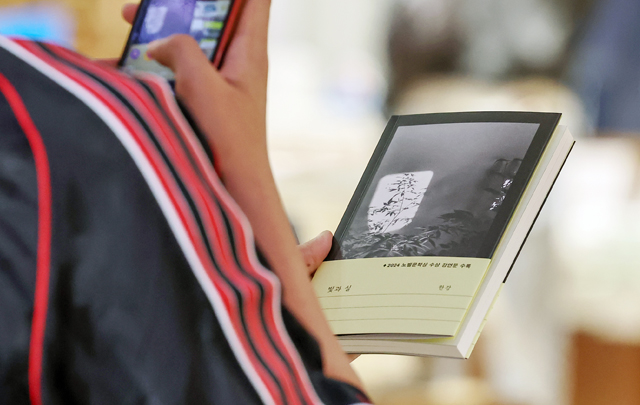|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아왔다. 지난달 21일 출국해 미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한 뒤 10일 만인 30일 귀국한 것이다. 이번 미국 방문은 박 시장이 이클레이(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초청되며 이뤄졌다. 순방기간 중 박 시장은 뉴욕과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 등 4개 도시를 숨 가쁘게 돌아다녔다. 평소 박 시장 업무 스타일대로 일정을 빡빡하게 짜다 보니 몇몇 약속장소에는 지각 도착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눈에 띄는 것은 박 시장의 경제 행보였다. 뉴욕에서는 씨티은행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해 '서울 세일즈'에 나섰고 실리콘밸리를 찾아서는 현지 투자자들을 설득해 서울의 스타트업(초기창업) 기업에 투자를 늘려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글로벌 거대자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박 시장은 1990년대 초반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을 한 후 돌아와 참여연대를 만들어 본격적인 시민활동을 시작했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두 번째 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박 시장의 경제공약이나 정책을 살펴보면 경제력 10위권 국가의 수도에 걸맞은 게 별로 없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실제 재선을 위한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중 상대후보에게서 '서울이 가라앉고 있는데 시장이 하는 게 없다'는 신랄한 비판을 사기도 했다. 정책에서도 복지가 두드러지게 강조돼왔다.
이런 박 시장이 글로벌 거대자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은 아니다. 달리 보면 서울이 처한 경제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여의도를 국제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특구로 지정하고 서울국제금융센터(IFC)를 건립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에 애를 쓰고 있지만 IFC 오피스동 3개 중 한 개는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초라한 실적을 내고 있다.
서울의 산업 95% 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절반 이상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이 차지하고 있다. 고부가인 금융이나 컨설팅 비중은 미약하기 그지없어 허울뿐인 서비스업으로 서울이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이 펴낸 연구자료를 봐도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DRP) 증감률은 수도권 GDRP 증감률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을 정도로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이 가라앉고 있다는 게 빈말은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박 시장도 서울에 곳곳에 실리콘밸리와 같은 5개 창조경제 거점을 추진 중이다. 수십 개의 대학들이 몰려 있고 우수 인재들이 즐비한 서울이야말로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초기 리스크를 무릅쓰고 마중물을 대줄 거대하고 과감한 자본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박 시장은 이번에 눈에 보이는 마천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자본의 파워를 더욱더 체감했으리라 믿는다. 시즌1이 복지에 주력했다면 시즌2에서는 글로벌 거대자본을 활용해 서울을 먹여 살릴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구상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글로벌 자본과 '절친'이 되도록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로 적극 세일즈를 나갔으면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