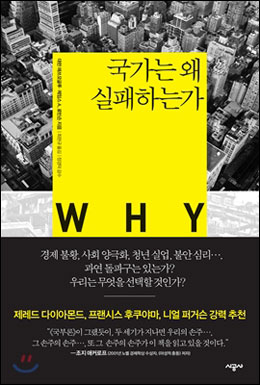|
|
실패한 국가들이 있다.
멕시코나 브라질ㆍ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은 18세기에만 해도 모두 유럽의 식민지였고 경제력도 비슷했다. 1800년대 말에는 아르헨티나가 미국보다 앞서기도 했다. 남한과 북한도 해방직후 상황은 비슷했고 1960년대엔 북한 경제력이 앞섰지만 지금은 역전돼 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해질까. 대런 애시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서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한다. 로마제국, 중세 베네치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방대한 세계사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의 통찰은 간명하다.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지리나 역사, 인종같은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사회제도에 있다는 것, 특히 사회제도 가운데 정치적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제도라는 게 저자들의 시각이다. 결국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가 바로잡혀야 된다는 논리다.
저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집중시키는 '착취적'(extractive)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잠재력을 보호ㆍ개발하려는 '포용적'(Inclusive)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한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걸쳐 있는 노갈레스라는 도시를 보자. 담장하나로 나뉜 이 도시의 양쪽은 딴판이다. 북쪽 미국주민은 한 해 소득이 3만달러지만 남쪽 멕세코 주민은 그 3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정치권이 대중의 요구에 부응한 제도를 만들고, 대중들은 그 제도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회를 향유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이 유독 영국에서 싹이 터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경제제도는 명예혁명이 가져다 준 포용적 정치제도의 기반 위에 마련된 것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한다.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도 같은 맥락이다.
수탈적 체제나 포용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는 있다. 한때 놀라운 성장을 이룬 옛 소련이나 현재의 중국이 그렇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뮤얼슨은 1961년 소련경제가 이르면 1984년이나 늦어도 1997년 미국을 제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저자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도 산업의 창조성을 제한하는 제도에 기반하고 있기에 큰 리스크가 있고, 포용적 정치제도로 방향을 틀지 않는 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체제는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자원을 다른 쪽에 몰아줌으로써 한동안 고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지속성은 없고 진정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2만5,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