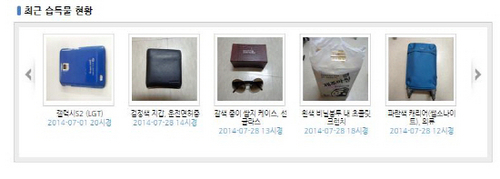|
|
|
|
보관 창고 문을 여니 250평 정도의 공간에 철제 선반에 놓인 갖가지 물건들이 저 멀리까지 늘어선 게 눈에 띈다.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제품부터 골프채, 악기, 양주 등등…. 어떤 것은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수북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다른 것은 방금 들어와 말끔한 것까지 분류번호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서울 성동구보건소 4층에 자리 잡은 ‘서울청유실물보관센터’에 종류도 다르고 사용기간도 이 물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잃어버린 주인을 찾기 위해서다.
한눈에 봐도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은 물건들도 즐비했다.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롤렉스시계, 등 고가품도 종종 들어온다고 한다. 이렇게 잃어버린 주인을 기다리는 유실물이 현재 3,800점. 대부분 지하철이나 공항, 길가에 뒹굴던 것을 수거한 것이다.
아까운 물건이 즐비하지만. 다시 주인의 손에 들어가는 유실물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관센터에는 2,565건의 유실물이 접수됐지만, 원소유주가 되찾아간 것은 20건에 불과했다. 주인에게 버림받는 비중이 99%에 이른다는 얘기다. 나머지는 습득자가 가져가거나 공매로 처리됐다.
유실물이라고 해도 바로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 일 주일은 지하철유실물센터나 파출소에 머물면서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원래 소유주의 품으로 돌아간 유실물이 전체의 80%에 달한다.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로소 서울청유실물보관센터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일단 이곳에 온 물건들은 시계, 귀금속, 카메라, 전자제품, 기타 등 5개 분류로 나뉘어 보관돼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경찰관 4명의 보호를 받는다.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9개월. 원소유주가 6개월 내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래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3개월 후 국가소유로 처리해 공매로 처분 한다. 매달 200개 넘게 쏟아지는 유실물을 무작정 쌓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낙찰액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이양래 서울청유실물보관센터장은 “센터의 유실물은 공매를 통해 국고환수가 될만한 상품가치를 가진 물건이다. 9개월이 지난 유실물 중, 지갑 옷가지 등 상품가치가 없는 물건은 폐기되거나 다양한 곳에 기부된다.”고 설명했다.
공매 규모는 매 분기 약 600개 정도. 특이한 것은 물품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공매대상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한다.
그러다 보니 여러 명의 업자가 짝을 지어 입찰에 참여하고 나중에 필요한 물품만 나눠 갖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6월 진행된 2·4분기 유실물 공매에는 629건의 물건이 나와 2,166만 원에 낙찰됐다.
경찰청은 유실물 종합안내시스템 LOST112(http://www.lost112.go.kr)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실물의 사진과 함께 습득장소 및 날짜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고 전국의 유실물 관리 기관 시스템과도 연계돼 있다.
이 센터장은 “주인들이 잃어버린 후 마음 아파했을 물건이 센터에 많다”며 “분실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LOST112에 접속해 계속 검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실물이 본인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번호나 사진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