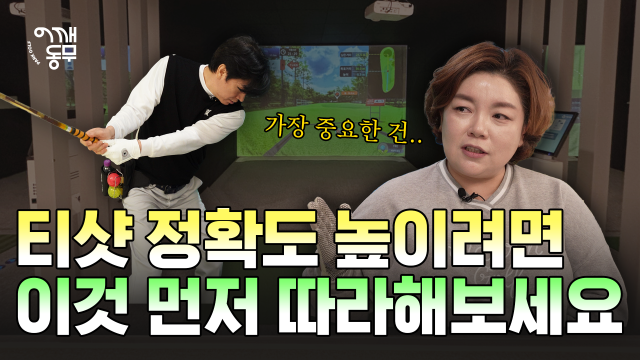북한이 이번에 쏘는 발사체는 그것이 설사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다. 국제사회는 2009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발사 행위를 일절 금지시켰다. 인공위성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장거리 미사일 성능시험을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앞선 발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지금 동북아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중국ㆍ일본이 일제히 권력교체가 이뤄지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도발의 저의는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12월17일)에 맞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일종의 이벤트라는 것이 첫 번째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집권 2기 출범을 앞둔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이 물론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19일로 예정된 우리나라 대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농후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직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향후 남북관계 구상이 뭔지 밝히라고 공개 질문을 던진 것은 여간 예사롭지 않다.
의도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북한이 도발로 얻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제재뿐이라는 사실이고 북한에도 이를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4월 북한의 도발 당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만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북한 도발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주도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망동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끝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번에는 반드시 치르도록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