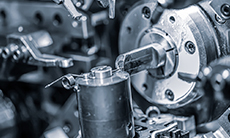|
세종시에서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가 설계와 달리 일부 철근을 빼놓은 상태로 시공됐다는 소식에 업계가 시끄럽다. 건설업계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발주처로 꼽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부실시공 소식에 난감해했으며 분양계약자들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시공사인 M사는 하청업체가 가불금 지급 거부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이라며 "잘못했지만 그래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철근을 절반이나 적게 넣고 시공한 어마어마한 부실을 찾아내지 못한 감리업체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1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참사가 시공단계에서 부실자재를 사용하거나 볼트를 적게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리가 원인으로 지목된 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비판의 수위가 더 높아진 모습이다.
국내 공사현장의 감리문제는 크고 작은 건축물 하자나 붕괴사고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다. 30년 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국내에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로 인해 감리제도가 상당히 발전됐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현장에서의 감리환경은 열악하다. 특히 시공사의 힘이 유독 센 국내 건설시장 환경에서는 중소 설계업체들이 주로 담당하는 감리의 '말빨'이 제대로 먹히기 힘들다. 한 감리업체 관계자는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이라면 조그만 변경은 눈감아줄 수밖에 없다"며 "공기 엄수를 위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감리업체는 환영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번 세종시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도 감리업계는 해당 건축사사무소를 동정하는 분위기다.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가 작정을 하고 부실공사를 진행한 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발주처 감리단이 감독할 당시에는 제대로 철근을 배열해놓았다가 나중에 이를 빼버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버리면 감리업체가 뒤늦게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감리업체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감리는 부실시공을 막을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실자재 사용이나 임의 설계변경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감리업체를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하는 공사현장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감리의 노력만으로 부실시공 척결은 요원한 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