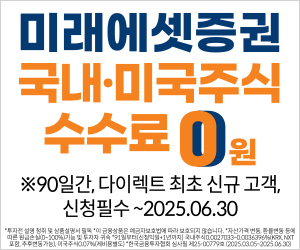이번 판결이 주목을 끈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다. 첫째, 현대차의 퇴직금·상여금 관련 규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정기상여금 지급기간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주면서도 상여금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주지 않는 단체협약 하부 세칙(細則)을 갖고 있다.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 적용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퇴직금 관련 세칙보다는 상여금 세칙을 기준으로 삼았다. 고정성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근로일수에 비례해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돼 있어야 충족된다.
둘째,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를 통합했는데 3사의 상여금 세칙이 다르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옛 현대정공의 경우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옛 현대차서비스의 세칙은 이런 제한이 없어 중간퇴직자 등에게도 상여금을 주게 돼 있으므로 고정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전체 근로자의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출신 근로자에 대해서만 100억원가량의 연장근로수당과 중간퇴직정산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모든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3년치 소급분 지급에만 직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씩, 5조3,000억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이후의 추가 임금부담도 훨씬 가벼워졌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진행 중인 임금체계 개편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조합원만도 5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의 통상임금 갈등수위가 낮아진 만큼 산업계 전반의 소송전과 혼란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기업마다 임금체계와 상여금 등에 대한 단체협약 하부 세칙이 달라 그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사정은 3월 말까지 통상임금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령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못 박아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