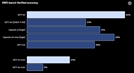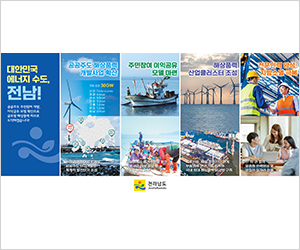행태주의 경제학자들은 이유 없이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을 '바보 중의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으로 설명한다.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는 종목을 매수하면서 또 다른 투자자가 더 비싼 가격으로 그 종목에 투자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이다. 최근 상장한 스팩(SPAC)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이 이론이 머리에 떠오른다. 스팩은 인수합병(M&A)이 가시화될 때까지 어떤 주가상승 요인도 없다는 게 정설이다. 특정 기업과의 합병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그저 현금만 손에 쥐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일 뿐이다. '미래에셋 스팩1호(미래스팩)'는 16일 상장 이후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처럼 아찔할 정도로 주가가 뛰어오르는데도 한 주라도 더 사려는 개미들이 많다. '수건 돌리기'와 비슷한 '단타 게임'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스팩이 '스페큘레이션(Speculationㆍ투기)'의 준말"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스팩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단타 개미'들은 이제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스팩 주식의 상한가 행진은 단순히 '수급'에 따른 것이다.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별한 이유 없이 커진 거품은 순식간에 꺼지고 만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인 스팩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다. 높은 주가에 스팩 주식을 매수했다가 팔지 못할 경우 '합병 실패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스팩이 합병에 실패해도 투자자들은 일정 수준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금 수준은 '공모가격'의 95%이지 '주식 매수가격'의 95%는 아니다. 미래스팩에 투자했던 기관투자자(발기인 제외)들은 상장 이후 사흘 동안 단 한주도 매수하지 않은 채 무려 104만주를 팔아 치웠다.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물량은 순수하게 개인투자자들이 가져갔다. 현명한 개인투자자라면 이 같은 매매동향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