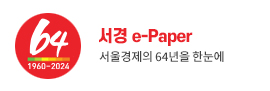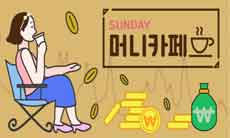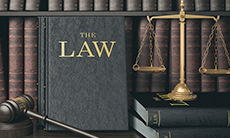역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소통과 협력은 인류문명을 이끌어왔다. 2,400여년 전부터 본격화한 교역로인 실크로드는 동서양을 발전시켰다. 동양의 종이와 화약, 서양의 태양력이 전해진 통로가 바로 유라시아 교역로였다. 우리 민족의 원류가 오래전에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로 유입됐다는 학설도 있다. 융성기의 우리 민족이 유라시아 곳곳에 남긴 흔적도 적지 않다.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다. 이념과 민족갈등으로 반목하던 이곳에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억압 대신 자치가 들어서고 경제적으로는 협력과 개발이 한창이다. 오랫동안 사실상의 섬나라로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고립돼 있던 한국으로서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저성장의 늪도 유라시아와의 소통과 교류 확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급한 점은 가능성에는 위기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이 가진 가능성을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 삼지 못할 경우 도태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중국, 자원의 보고인 중앙아시아를 거쳐 터키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가 제2의 실크로드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물론 친선특급을 '알맹이 없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시성 행사'로 폄하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를 극복하고 성과를 내려면 북한을 설득하는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250여명의 참가자들도 외교사절 이상의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성공을 기원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