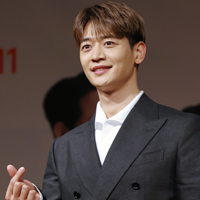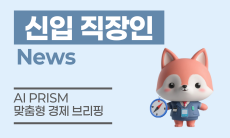|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보면 훌륭한 학자나 선비, 용맹한 장수, 덕치를 실현한 임금, 의로운 농민, 심지어 충직한 노비에 관한 얘기들은 풍부하지만 '위대한 상인'은 거의 없다. 반도국의 지리적 위치를 따져보면 당나라와 신라의 해상무역을 연결했던 장보고 같은 인물이 많을 법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저자는 이를 "우리 조상들이 사농공사 가운데서 상업과 상인을 억압하고 천시함으로써 민족사의 핵심 축으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제학을 전공한 공직자 출신이며, 현직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인 저자는 2000년대 초 읽은 '고려사'에서 화려한 상업문화와 대외교역에 얽힌 역사를 접한 이후 역사 속 상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와 관련된 세 번째 저서인 이 책은 고대부터 개성상인에 이르는 7,000년 한국 상인의 방대한 역사를 세밀한 논증과 함께 담고 있다.
물물교환에서 시작된 상거래와 상업은 선사시대부터 존재해 왔다. 이 책에서 한국상인의 태동은 7,000년 전 동이족이 꽃피운 홍산문화와 요하문명에서 시작한다. 동이족은 중국인들이 주변 민족을 지칭하면서 동북지역에 살던 우리의 조상을 부르는 이름이다. 저자는 이들 고대 문명을 근거로 "문명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 자체에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문명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수많은 재화를 몇몇 부족이 온전히 공급할 수 없는 만큼 인류문명은 교역과 교류를 주도한 상인의 노고가 배어있다"고 주장한다.
동이족의 문명을 지탱한 고조선은 무너졌지만 한반도에 터전을 마련한 우리의 선조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며 대외교역으로 '새 판'을 짜려고 시도했다. 고구려의 정복전쟁, 가야시대 낙동강 하류에서 남해안 지역의 해상무역권을 차지하기 위해 가락국과 경쟁하던 포상팔국(浦上八國), 근초고왕의 해양백제 추진 이야기 등은 잊고 지내온 한국인의 상업에 대한 의식을 일깨운다.
책은 고대부터 고려, 고려부터 개성상인까지로 크게 나뉜다. 특히 고려의 찬란한 상업문화, 상업경제와 더불어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 시기에 최영을 중심으로 한 상업 우호세력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상업 천시 세력간의 투쟁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눈길을 끈다. 조선의 상인 천시를 이겨낸 '개성상인'의 활약상을 통해 저자는 무역대국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세계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3만3,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