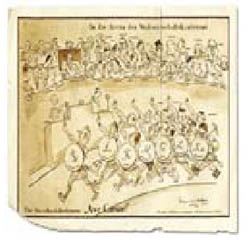|
1933년 6월12일, 영국 런던. 전세계 67개 국이 모였다. 한창때 국제연맹 회원국 63개 국보다 많은 나라가 모인 목적은 불황 타개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1929년 미국 증시 대폭락의 여파로 세계 무역량이 70.8% 줄어든 상황에서 열린 세계경제회의는 각국의 기대를 모았다. 회의의 정식 명칭은 ‘통화 및 경제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당초 명칭은 ‘금융 및 경제’였지만 ‘금융’ 대신 ‘통화’가 들어갔다. ‘금융’이란 말이 붙으면 전쟁 채무(미국의 영국ㆍ프랑스 등에 대한 차관) 탕감 문제로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 때문이다. 각국 총리와 외무장관ㆍ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한 의제는 크게 통화 공조와 무역장벽 철폐 두 가지. 국제 공동통화 ‘디나르(Dinard)’ 도입도 논의되고, 특히 미국과 영국ㆍ프랑스 간 통화안정협정은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 회의의 최종 결과는 파국. 각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7월 초 발표한 ‘통화 안정은 민간은행의 문제이지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교서가 3국 간 통화안정협정을 깨뜨렸다. 미국 상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달러가치 절하가 필수적이며 국제공조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루스벨트의 입장은 세계경제회의를 바로 무력화시켰다. 세계경제회의 실패 후 시대의 조류는 블록화. 미국은 남미에 공을 들이고 독일과 이탈리아ㆍ일본은 파시즘으로 치달았다. 세계경제회의는 2차 대전으로 향하는 이정표였던 셈이다. ‘실패한 국제경제협력’의 본보기라는 런던회의는 현재진행형이다. 국제기후협약을 거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는 나라들이 여전하니까. 국제관계에서 명분은 후순위일 뿐이다. 기본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