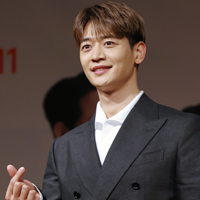스팩의 목적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기업 인수합병이다.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량한 기업이 합법적인 우회상장으로 증시에서 자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적이다. 페이퍼컴퍼니인 스팩에 투자한 주주들은 우량 기업 인수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어 유망한 투자처로 떠올랐다.
하지만 초창기 스팩 4곳의 운명은 이변이 없는 이상 당초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특히 9월부터 속속 도래하는 청구서 제출 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은 올 초부터 이들 스팩 대부분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그나마 공모자금 대부분을 신탁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덕분에 상장폐지되더라도 투자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에 성공한 스팩 6곳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스팩은 상장 이후 3년간 이자수익 정도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자수익을 내는 게 스팩의 목적은 아니다. 올해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초창기 스팩 4곳이 6월까지 쓴 영업비용은 20억원이 넘는다. 급여와 지급수수료ㆍ건물관리비ㆍ세금 등의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이 쓰였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지난해까지 스팩 관련 업무를 맡았던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다면 스팩을 상장한 증권사들의 직무유기가 도마 위에 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도 할말은 많은 듯하다. 업계와 거래소가 나서 스팩의 합병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당국에 건의했지만 사실상 스팩에 대한 관심이 꺾인 상황에서 어떤 처방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당국은 이미 스팩과 관련한 제도 정비를 마쳤고 업계 스스로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축포를 터뜨리며 시작했던 스팩 시장은 1호 스팩의 쓸쓸한 퇴장이 보여주듯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스팩의 자진 사망신고 사례가 초기 스팩 4곳의 실패로 끝나려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당국이 내놓은 스팩 활성화 대책과 같은 뒷북이 아닌 적시의 대책 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