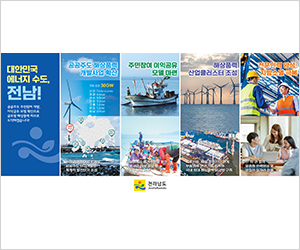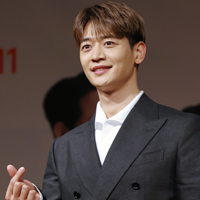|
|
최근 국민은행 사태로 5개월째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나라가 시끄럽다. 한국 리딩뱅크의 두 리더가 모양 사납게 싸우다 급기야 한 명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버티기를 하다 기어코 해임되더니 소송 얘기가 들린다. 국민은행 자체가 무주공산인데다 이전 정부 때도 낙하산 최고경영자(CEO)들이 번번이 추태를 부렸으니 이러한 혼란사태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작금의 KB국민은행 사태가 용납될 수 없는 이유를 보자. 첫째, CEO들 간의 갈등 혹은 무능 등은 곧바로 은행경영의 위험으로 직결된다.
낙하산 CEO 영향으로 이사회 등 마비
CEO는 은행경영의 기본인 4대 위험(신용위험·시장위험·유동성위험·운영위험)을 잘 관리해 국민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금융중개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에 실패할 경우 곧바로 은행의 위험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실제 KB의 경우 이는 약 1조3,000억원의 주가하락으로 나타났다.
둘째, 낙하산 회장과 CEO가 그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직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국민은행은 국내 리딩뱅크로서 직원 수만도 2만2,499명이지만 그들은 모두 CEO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은행 CEO와 지주회사 회장이야 좋은 대우 받고 특권을 누리다가 임기가 만료돼 떠나면 그만이지만 직원들은 문제의 CEO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의 갈등과 금융당국의 사태수습 과정을 보면 한국 금융기관 경쟁력의 문제가 그대로 보인다. 필자가 학부 4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금융기관경영론의 기본방정식인 '금융기관 역량 + 강력한 금융감독=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에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역량은 앞서 설명했듯이 4대 위험을 관리하는 역량, 즉 CEO의 역량에서 나온다. 원래 정석대로라면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풀에서 이사회가 CEO를 선출하는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늘 낙하산 CEO에 그 CEO가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는 식이니 CEO의 역량을 감시해야 하는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이번에도 이사회는 사외이사들을 임명한 지주회사 회장 편을 들면서 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사태를 키웠다, 이는 이사들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한국 문화·경제에 맞는 지배구조 필요
금융감독기관도 갈등을 조기에 막지 못한 책임이 큰데 이 역시 낙하산 인사와 관련이 깊다. 전직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감사·사외이사로 가 있기 때문에 서로 봐주기 차원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사실은 낙하산 인사가 만연해 더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그동안 정책당국은 금융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서양식 은행의 지주회사 제도를 모방했지만 이 제도 시행에서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정책 당국도 이 제도가 한국의 문화·정치·경제구조에 맞는지 진단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는 한국식 은행지배구조와 금융감독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경영에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은 금융권 접근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모피아라는 치욕적 용어도 사리지고 한국의 금융산업에도 미래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