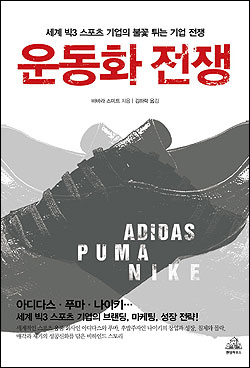'운동화 전쟁' 바바라 스미트 지음, 랜덤하우스 펴냄<br>아디다스·푸마 창업자들의 전기로 본 스포츠산업 역사<br>무한경쟁 현실·정치권과 연계^성공기업 노하우등 담겨
 |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육상 100m에서 금메달을 딴 뒤 푸마의‘골든 슈즈’에 입맞춤하고 있는 우샤인 볼트.(위)
아디다스가 후원하는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의‘베컴 글로브 축구화’(아래) |
|
스포츠 기업들에서 세계적 선수를 앞세우는 마케팅은 업계의 정석으로 여겨질 정도로 일반화가 되고 있다. 지난달 막을 내린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00m육상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자메이카 출신의 우샤인 볼트 선수. 그는 결승점을 통과해 푸마의 ‘골든 슈즈’를 연신 내 보이며 화려한 세러모니를 선보였다. 자신의 후원사인 스포츠 업체 푸마를 알리기위해 사전에 연출한 모습이었다.
푸마는 세계 220개국 44억 TV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브랜드 홍보 효과를 얻어냈다. 반면 같은 경기에서 나이키가 후원했던 아사파 파월은 5위에 그쳤고 아디다스와 계약했던 타이슨 게이는 예선 탈락하면서 스포츠용품 업체들의 희비는 극명히 엇갈렸다.
세계 스포츠 산업의 리더 아디다스와 푸마는 각기 다른 브랜드지만 뿌리는 같다. 두 기업의 탄생은 1920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의 직공 출신이었던 크리스토프 다슬러의 두 아들 루돌프(애칭 루디)와 아돌프(애칭 아디)는 아버지에게 배운 신발 봉재기술을 바탕으로 신발공장을 차렸다.
당시 독일에서는 팍팍했던 삶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해 준 스포츠 특히 축구가 인기였는데 이들에게는 큰 기회였다. 형제가 만든 축구화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회사는 크기 시작했다. 1930년대 초 스포츠로 군사적 미덕을 함양하겠다는 히틀러의 스포츠 진흥책은 형제의 성공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나 재무와 마케팅에 뛰어났던 형 루돌프와 기술자였던 아돌프 간의 우애는 서로를 믿지 못할 만큼 금이 가 법적 분쟁을 할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둘은 갈라섰다. 형은 푸마를, 동생은 아디다스를 각각 설립하면서 등을 돌린 채 피 튀기는 경쟁에 돌입했다.
책은 아디다스와 푸마의 창업을 시작으로 두 회사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이를 딛고 다시 재기하는 과정을 그린 기업사이자 한 형제의 전기다. 두 업체의 성장사를 통해 후발주자인 나이키 등 세계 스포츠 업체들의 성공전략과 스포츠 스타와의 관계 등 스포츠 산업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1936년 아디다스를 신고 육상 4관왕에 오른 미국의 제시 오웬스를 비롯해 체조 요정 나디아 코마네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켐에 이르기까지 쟁쟁한 스포츠 스타들이 이들 빅3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준다.
스포츠 정치학도 빠지지 않는다. IOC(국제 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이었던 브룬디지와 사마란치, FIFA(국제축구연맹) 위원장 아벨랑제와 블라터 등 세계 스포츠 인사들과 기업간에 얽힌 뒷이야기도 흥미롭다.
저자가 직접 발로 뛰며 만난 창업자들의 가족과의 인터뷰와 오랜 시간 수집한 자료로 한 가족이 펼치는 치열한 스포츠 기업의 역사가 소설처럼 펼쳐진다.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내용 속에 신제품 개발 경쟁, 마케팅, 사업다각화 등 기업간에 벌어지는 무한경쟁과 성공기업의 경영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