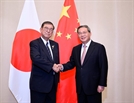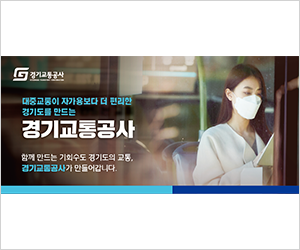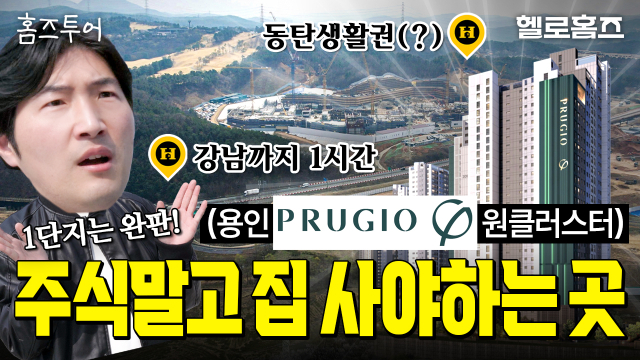|
불볕 더위에 숨이 막혀 무작정 집을 나선다.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노들섬'이라고 적힌 행선지가 적힌 버스에 올랐다. 그냥 '노들'이란 이름이 좋아서 주말 피서의 목적지가 됐다. '백로가 노닐던 징검돌'이란 뜻이라고 하니 그 섬에 가면 백로를 볼 수도 있을까. 한강을 끼고 아스팔트 길을 한참 달리다 도착한 노들섬은 가끔 한강대교를 지나치다 보던 분위기와 달랐다. 더운 바람을 조금 참고 걸으면 조그마한 숲에서 땀을 식힐 수 있고 정돈된 산책로는 도심 속 달궈졌던 머리를 식혀주는 것도 같다.
한창 전임 시장이 오페라하우스를 만든다고 떠들썩하던 노들섬은 요즘 서울시가 만든 노들 텃밭이 됐다. 풋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상추에 오이, 도심에서는 좀체 보지 못하던 수세미까지 아기자기 가꿔져 있는 텃밭이 한 박자 쉬어가는 느낌이다. 오페라하우스가 시민을 더 위할지 텃밭이 시민을 위할지는 노들섬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것이다. 하긴 모 음대 교수님은 문화 공간으로 노들섬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들섬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텃밭이 됐다는 것은 두 손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노들 텃밭 주변을 휘감고 있는 각종 구호들은 이 텃밭이 시민 모두의 텃밭인지 일부 시민단체나 농민단체를 위한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 텃밭 한가운데 '해방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4대강 반대' '두물머리에 농사를 허하라'는 등의 각종 붉은색 구호의 플래카드는 도심 속 쉼터를 바라고 왔던 주말 피서객을 불편하게 만든다. 정치적 표현은 자유다. 하지만 어렵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누구나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또 다른 정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노들섬은 지난 1968년 한강 개발 계획으로 백사장이 사라지고 1970년대 초반 옹벽을 높게 쌓으며 시공사인 건설업체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한 차례 주인이 바뀐 후 2005년에야 서울시가 매입해 시민의 소유가 됐다. 높다란 울타리에 사유지로 있던 한강의 섬이 어렵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모든 이슈의 최우선이라 해도 지나친 정치 과잉은 부담스럽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