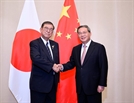개별적인 제안은 더욱 매력적이다. 보잉사는 한국군이 바라던 최신 장비인 가상 전장모의 시스템(LVC) 제공을 제안했다. 록히드마틴은 LVC는 물론 숙원사업인 군사용 통신위성 사업 지원을 들이밀었다. EADS는 더욱 파격적이다. 60대 가운데 53대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레이더와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의 기술이전을 제안했다. 심지어 미국에서 단 한번도 넘겨주지 않은 코드소스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하나같이 탐나는 기술이다.
전투기 제작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단순한 입찰경쟁 차원을 넘어 생사의 향방이 걸렸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방비 감축 추세로 사업물량이 극히 드물 뿐 아니라 각 기종마다 약점을 갖고 있다. F-15SE는 F-15E에 제한적인 스텔스 기능을 부여하고 레이더를 최신형으로 교체한 기종이나 원형의 설계가 구식인데다 대량생산 근처에도 못 간 기체다. F-35A는 성능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어 미국 의회에서조차 ‘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미완성 기종이다. 미국 정부가 3년 내 실전배치를 약속하고 있으나 불투명하다.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다가 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나라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유일하게 실전경험을 쌓은 유로파이터 역시 유지비용이 막대하다는 약점이 있다. 불경기와 성능 미검증이 겹쳐 수주성공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량확보에 직결돼 있는 셈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갑(甲)도 이런 갑이 없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각 기종의 장단점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왔다고 믿는다. 문제는 선택 이후다. 약속 이행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지난 1983년부터 시작된 역대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제시된 기술이전ㆍ절충교역의 대부분이 흐지부지됐다는 점을 기억하자. 이번에는 미이행시 배상청구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약연기라는 강수를 동원해서라도 정부는 필요한 바를 확실하게 얻어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갑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할 때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