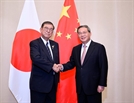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만난 한 제병업체 관계자의 하소연도 겉보기에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요즘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진원지는 대ㆍ중기 동반성장 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정부이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식음료, 의류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통제에 나섰다.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많이 푼 데다 고환율 정책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자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품목부터 오르지 못하게 틀어막았다.
생산원가는 올라가는데 가격결정권은 없으니 소비자와 접점에 놓인 기업은 수익성 하락의 위기에 직면했다. 자연히 기업들은 고강도의 비용절감에 나서게 되고 납품업체들을 쥐어짜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품목마다 2~3개 주요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수요독점 시장에서 납품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기업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손해가 나더라도 일단 공장을 돌려야 고정비라도 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관치(官治)물가 정책이 정부발(發)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돌아온 셈이다.
중소기업이 고질적 병폐인 '인건비 따먹기'식 영업을 넘어서려면 적정수준의 마진 확보가 필수적이다. 충분한 이익을 확보해 지속적인 재투자를 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우수 인력을 끌어와야 한 단계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 발족과 중기적합업종 지정, 정책자금 확대편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선 정부가 도리어 이들의 목줄을 죄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물가 잡기는 기업 팔목 비틀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관치의 칼날은 언제든 '정부실패'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