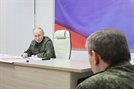대표적 사례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사상 최초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굴욕'을 겪었던 미국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계단 끌어내렸던 지난해 8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당시 2.5%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5%선으로 오히려 하락(국채 값 상승)했다. 투자자들이 S&P의 조언을 따르기는커녕 도리어 미국 국채로 몰려든 것이다.
올해 영국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무디스는 지난 2월 영국의 신용등급전망을 향후 강등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으로 제시했으나 투자자들은 개의치 않고 영국 국채를 사들였다. 당시 2.1% 내외였던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1.6%선으로 하락했다. 무디스는 8일에도 그리스 위기로 독일을 포함한 전 유럽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가나 기업의 부도위험을 계량화해 채권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신평사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긴축을 부추기는 신평사의 평가기준이 도리어 경제위기를 악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혹독한 긴축을 할수록 국가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재정이 더 악화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최근의 신용등급-국채 값 반비례 현상은 유럽 재정위기로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에 쏠리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신평사들의 독점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처드 실러 뉴욕대 금융역사학 교수는 "신평사들이 정부로부터 지나친 특혜를 받아왔다"며 "S&Pㆍ무디스ㆍ피치가 마치 정부의 공식기관인 듯한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